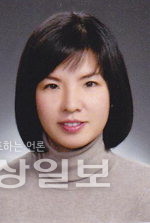
필자의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봄소풍에서 빠질 수 없는 행사 중 하나가 보물찾기가 아니었나 싶다. 이 놀이를 작품으로 본다면, 영국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모험소설 ‘보물섬’이 대표적이 아닐까 한다. 이 작품은 아들이 그린 가짜 지도에 영감을 얻어 쓰기 시작한 글에 자신의 아들과 토목기사였던 아버지까지 3대가 참여하면서 작품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처럼 보물찾기 모험에 대한 로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맘에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건축과 예술로 승화시킨 사례도 많다.
일본의 혼슈와 시코쿠 사이의 좁고 긴 바다와 해안지역인 세토내해에는 우리나라 다도해를 연상케 하는 수많은 섬이 있다. 이 섬들을 배경으로 봄, 여름, 가을 108일 동안 열리는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는 연간 방문객 수가 100만명을 넘는다. 한국에서도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을 정도다. 가장 지역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글로벌하게 성공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 지역의 사례는 예술을 통한 지역 재생의 성공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 남쪽 해안에 있는 작은 섬들에서의 예술제가 대박이 나기까지는 오랜시간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 시작은 1980년대 나오시마섬 프로젝트에서 시작됐다. 당시 나오시마는 미쓰비시제련소로 인해 섬의 절반이 민둥산이 돼 있었고, 구리 가격 폭락으로 인해 섬의 인구가 줄어가던 시기였다. 또 이 지역은 국립공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다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을 접었던 곳이기도 하다.
베네세그룹의 후쿠다케 소이치로 회장은 이런 나오시마를 전 세계인이 찾는 예술의 섬으로 만들고자,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를 찾아가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오시마 문화촌’ 계획을 의뢰했다. 당시에는 누가 현대미술을 보러 이런 촌구석까지 오겠냐는 핀잔을 듣던 프로젝트였으나 3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의 나오시마는 죽기 전에 한번은 가봐야 할 명소가 됐다.
나오시마에서는 문화촌 계획의 시작을 같이 한 안도 다다오의 ‘색을 배제한 노출 콘크리트 건축 작품’을 접할 수 있는데, 베네세하우스, 지추미술관, 이우환미술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건축물들의 공통점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지하로 공간을 깊게 파서 자리잡게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추미술관은 클레드 모네, 제인스 터렐, 월터 드 마리아 등 3인의 작품을 테마로 빛과 공간을 설계해 건축공간을 또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예를 들어, 모네의 수련을 자연광으로만 감상할 수 있게 설계해 미술관 안에서 해가 뜨고 지는 순간까지 작품의 느낌을 달리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나오시마섬에는 여성건축가 세지마 가즈요가 설계한 페리 터미널 ‘바다의 역 나오시마’, 후지모토 소우의 ‘나오시마 파빌리온’, 혼무라에 산부이치 히로시의 지역 세미기후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 ‘나오시마 홀’ 등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시마섬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되자 주변 섬들도 동참해 예술과 문화의 섬군락을 만들게 됐다. 이에 현재의 세토우치 트리엔날레와 같은 세계적인 예술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쇼도시마섬에 가면 옛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학교밖 자연과 건축물의 관계를 재해석해낸 아시아 아트 플랫폼인 ‘후쿠다케하우스’를 볼 수 있고, 메기지마에서는 야외 음악 공연장인 ‘메기하우스’에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으며, 마루가메 역전 광장 앞에서는 현대미술관인 MIMOCA뮤지엄을 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배를 타고 보물찾기 같은 여행을 즐길 수도 있다.
한국에서도 군위 사유원에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생겼는데, 이곳은 섬이 아니라 경상북도 산속에 만들어져 있다. 방문객들은 숲속을 산책하면서 플리츠커상을 수상한 포르투칼 건축가 알바로 시자의 소요헌, 소대와 건축가 승효상의 명정, 망우정, 조사 그리고, 최욱의 가가빈빈 등을 만날 수 있다. 이제 막 일반인의 관람이 시작된 곳이라 나오시마와 같은 확장된 프로그램이 구축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지만, 앞으로 주목되는 장소이다.
우리 울산은 산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바다와 산, 그리고 강이 있어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제 신의 축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또 다른 명물 공간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정수은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