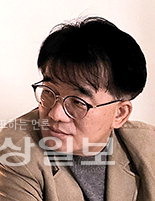
“내가 세상 사람들이 어린아이 가르치는 것을 보니, 자신이 아는 것을 아동이 깨우치지 못함을 책망만 하고, 어제 가르쳐준 것보다 오늘 발전이 없으면 노여워한다. 만약 자기 뜻과 같지 않으면 곧 눈을 부라리고 화를 내고, 심하면 손발로 때리거나 마구 회초리질하곤 한다. 아이들은 어쩔 줄을 몰라서 도리어 이미 알고 있는 것까지 잃어버리게 된다. 그 중 어리석은 아이들은 어른을 적으로 여기고 책 보기를 원수 같이 한다.”
위의 글은 조선후기의 재야 지식인이었던 윤기(1741~1826)가 쓴 <교소아(敎少兒)>에 나오는 글이다. 조선후기에는 유교이념이 강화되고 가문현창의식이 심화되었는데, 이를 뒷받침한 것이 과거제였다. 조선시대의 교육이 과거 시험 위주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과거시험 위주의 교육이 가져온 가장 큰 폐해는 교육의 진정한 목적 상실이었다. 수기치인의 교육은 형식에만 머물렀고 입신양명을 위한 암기 위주의 몰입식 교육이 일반적이었다. 아동에게 집안과 가문을 빛내기 위해 학업에 매진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일관해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아동교육에 아동이 없다는 데에 있다. 아동 대신 부모의 욕심만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오히려 요즘이 더 심한 것 같다.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부모가 입시에 목숨을 거는 것만 해도 그렇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을 위하는 것인가. 윤기의 다음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가 들으니 어떤 사람이 그 자식을 가르침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점이 있으면 송곳으로 찔러 드디어 아이가 놀람증을 얻었다고 한다. 이렇다면 사랑으로 가르쳤던 것이 오히려 해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사람들의 어리석고 망령됨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송철호 인문고전평론가·문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