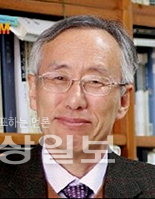
해마다 한글날 즈음 되면 나는 말글살이에 대해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반성하기도 한다. 무슨 인연인지는 몰라도 평생 한글과 우리말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연구로 살아온 한 사람으로 올해도 한글날이 다가 오니 나도 모르게 여느해처럼 우리말글살이에 대해 한 마디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세상은 갈수록 입말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그림이나 문자(글말)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 음식 주문도 식탁에 앉아서 하거나 주문판글을 보고 소비자가 직접하는 시대다. 아예 무인 카페가 생기기도 한다. 손님과 주인 사이 주고받는 입말은 필요 없고 빼곡히 적혀 있는 글자들을 읽고 글자대로 따라 해야만 뭘 사고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 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글말을 모르면 살아가기 힘드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세상에 만약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안내글이나 주문글들을 쉽게 읽어낼 수 있을까. 그때마다 나는 한글의 고마움을 생각하곤 한다.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문자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로마자를 쓰고 있을까. 아니면 한글 없었을 시대처럼 한자를 빌려쓰거나 한문으로 우리말을 적으면서 살고 있을까.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우리 배달 겨레에게 우리말을 그대로 적을 수 있는 신비로운 소리글자인 한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행운이고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겨레가 수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남아 세계 선진국이 된 것은 누가 뭐라해도 한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정 우리는 한글의 고마움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세종대왕이 신비한 글자를 만든 지 577년이 지났다. 우리 겨레가 온전한 말글살이를 한 지가 육백 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글자 없던 수천 년 동안 우리겨레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으며, 어떤 문화를 남겼는지 알 수가 없다. 문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문으로 조금 남기긴 했지만 그건 맹인 소 더듬는 격이다. 세종이 한글을 만들어 줌으로써 배달겨레는 어두운 소통의 세계에서 밝은 소통의 세계로 나가게 된 것이다.세종은 ‘나라말이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백성이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려고 해도 능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가엽게 생각해서 글자를 만들었다’고 만천하에 알렸다. 동서고금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임금과 지도자가 백성의 언어 생활을 이처럼 염려했으며 어느 임금이 손수 글자를 만들었던가.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다행히 쉬운 한글이 있어 누구나 글자는 쉽게 읽을 수 있으나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를 마구 써서 글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뜻을 모르니 새로운 문맹자가 된 것이다. 글자 모르는 문맹자가 아니라 글의 뜻 모르는 문맹자가 생겼다. 그런 문맹자가 75%라는 통계도 있다. 온통 어려운 외래어를 써놓으니 나이 든 세대는 전자 기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쩔 줄 모른다. 살아가기가 더 어렵게 된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외래어나 로마자를 쓰면 유식해 보이고 외래어를 고급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언제까지 한글이나 우리말을 쓰면 촌스럽고 유치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겨레는 오랫동안 한문으로 우리말이 죽었고, 나라잃은 시대에는 일본말 때문에 또 우리말이 죽었다. 그리고 지금은 영어로 우리말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도 세계에서 강대국이 되었고 선진국 반열에 섰다. 따라서 우리말글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세계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말글을 배우려고 줄을 섰으며 우리 음악과 음식, 예술, 문화를 배우려고 야단이다.
말과 글은 우리 겨레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말이 살면 겨레가 살고 말이 죽으면 겨레가 죽는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제 제발 어려운 외래어와 글자로 허세를 부리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임규홍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