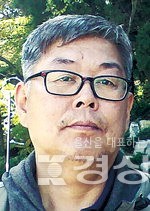
요즘 사방에 민들레가 지천이다. 민들레는 동의보감에서 포공초(蒲公草)로 불렀는데, 현재의 한약명은 포공영(蒲公英)으로 불린다. 포공이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됐는지는 몰라도 옛날부터 서당 훈장을 포공(蒲公)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서당 마당에 민들레를 심어 민들레가 가진 아홉 가지 덕을 배우게 했다고 한다. 이른바 포공구덕(蒲公九德)이다.
구덕의 첫째는 인(忍)이다. 민들레는 사람이 밟든 수레에 짓밟히건 꿋꿋하게 참고 생존한다. 둘째는 강(剛)이다. 뿌리를 캐 며칠 동안 볕에 내놓은 후에 심어도 싹이 돋는 강인함이 있다. 셋째는 예(禮)이다. 한 뿌리에서 여러 송이의 꽃을 피우는데, 동시에 피는 법이 없고 한 꽃대가 피고 진 후에야 다음 꽃대가 핀다.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예절이 있다. 넷째는 용(用)이다. 어린잎은 나물로 무치고 뿌리는 김치를 담그고 꽃은 술이나 차로 먹을 수 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다섯째는 정(情)이다. 꿀이 많고 향이 진해 벌, 나비들을 끌어들이고 찾아온 벌, 나비에게는 꿀을 주어 보낸다. 주고받는 정이 많다.
여섯째는 자(慈)이다. 잎이나 줄기에 상처가 났을 때는 하얀 빛의 젖이 나와 상처를 감싼다. 어머니의 손길 같은 자애로움이 있다. 일곱째는 효(孝)이다. 민들레는 흰머리를 검게 하며 늙은 부모를 젊게 하는 회춘약재로 쓰인다. 여덟째는 인(仁)이다. 민들레의 즙은 종기를 낫게 하며 열을 내리게 한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어짐이 있다. 아홉째는 용(勇)이다. 씨앗이 제 힘으로 바람을 타고 날아가 스스로 융성한다. 모험심과 자수성가의 용기가 있다.

쇠똥 떨어진 길섶 보리밭 두렁/ 민들레 속씨 하나/ 낙하산을 반쯤 펼치고 있다// 잡초 속에 홀로 꿋꿋한/ 샛노란 민들레 깃발// 어느 맑고 빛나는 봄날/ 어미 꽃과 작별을 하고/ 민들레 갓털이 바람 타고 날아간다// 민들레의 절반은 바람이다…(후략) ‘민들레의 절반은 바람이다’ 일부(김민자)
민들레는 아침해가 뜨면 꽃을 피우고 저녁이 되면 꽃잎을 오므린다. 그러다가 노란 꽃잎이 호호백발로 변할 무렵 꽃받침이 무너지면 백발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 자세히 보면 바람에 날리기 쉽게 씨앗에 솜털 같은 낙하산이 달려 있다. ‘갓털’이다. 입으로 불면 100여개에 이르는 갓털들이 일제히 날아간다. 민들레의 일생처럼 우리네 생도 결국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닌가. 이재명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