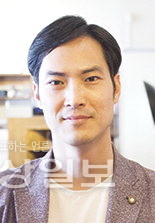
계몽은 프랑스어로 빛을 뜻하는 뤼미에르에서 유래했다. 계몽 운동은 17세기 유럽에서 이성의 빛으로 비합리적인 믿음, 방식, 풍습 등으로 생긴 어둠을 몰아 내자는 취지로 생겨났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시작된 계몽운동은 독일 등과 같은 유럽국가로 퍼져 나갔다. 독일의 위대한 사상가 칸트는 계몽에 대한 생각을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1784)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칸트에 따르면 계몽이란 인간이 아직 ‘미성년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미성년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 즉, ‘생각하는 능력’이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생각할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며, 권력이나 권위에 복종하려는 관성이 우리를 강하게 지배한다. 그래서 칸트는 “과감히 알려고 하라!”라고 권면하며,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할 자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그의 생각은 ‘표현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생각하는 능력의 사적 사용과 공적 사용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는 능력의 사적 사용은 각자가 맡은 역할, 직책만을 잘 수행할 때에 발휘된다. 의사는 진료만, 교사는 수업만 계획대로 잘 하면 된다. 그러나 각자가 맡은 역할만 충실히 한다고 해서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진보하지는 않는다. 2차 세계 대전 나치정권이 유대인을 학살했을 때, 그 일에 관여한 이들의 일부는 “내가 맡은 바에 충실했을 뿐이다”라는 자기변호를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예는 생각하는 능력의 사적인 사용을 넘어서 공적인 사용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칸트가 말하는 공적인 사용이란 자신이 맡은 직책이나 역할을 넘어서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피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서로 연대하여 문제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위해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포함하는 말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비합리적인 믿음과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 권력, 권위, 직책, 미신 등으로 한 개인의 행복을 짓밟거나 사회적 안녕을 저해하는 사건사고들이다. 이런 이유로 칸트의 계몽사상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김남호 울산대 객원교수·철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