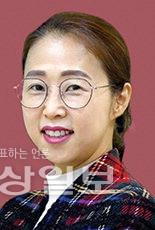
초등학교 시절, 교과서에서 품앗이, 두레와 같은 서로 돕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다. 혼밥 혹은 혼술이 일상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요즘 시대 개념과 다를 수 있지만, 뉴노멀(New Normal)의 관점에서 이것은 ‘공동체’라는 형태로 시대에 맞게 변화하면서 함께 해왔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공동체는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것은 정원의 범주에서도 볼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는 동안 공동체 정원(Community Garden 또는 Allotment garden)은 ‘함께’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다.
뉴질랜드의 더니든시는 땅의 3분의1 이상을 정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할당된 공간 및 커뮤니티 정원, 플롯 등은 비영리 용도로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게 대여한다. 스웨덴 스톡홀름시에는 약 1만개의 할당 구획이 있다. 그 구획은 210ha의 토지를 차지하고 2만4000명의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다(c.f. Barthel et al., 2010). 일본은 영국의 얼라트먼트 정원(Allotment garden)을 모델로 지역 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도시녹화기금이 운영하는 커뮤니티가든 네트워크가 NPO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고령자의 삶의 보람 만들기, 노후도시시설 철거지의 재생, 장애자 복지, 지진이나 태풍 등 환경악화 대응으로 시작하여 현재의 공동체정원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의 한 형태로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실천한다.
미국의 경우, 공동체정원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당히 체계적이다. 뉴욕시는 북미에서 가장 많은 550여개의 공동체정원을 운영하고 있다. 화훼중심의 정원형에서 텃밭이 포함된 형태들이 등장하는 추세이며, 최근 조성된 공동체정원은 저소득지구에 주로 배치된다. 여기에 도심 녹지 비율을 높이고 미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야간조명과 더불어 도시경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목적도 달성하고 있다.
시애틀의 공동체정원은 피패치(P-patch)라 불리며, ‘인클루시브 커뮤니티(Inclusive Community) 가드닝 정책’을 포함하여 시애틀 근린국이 관리한다. 인클루시브 커뮤니티 가드닝 프로그램은 인종, 종교 등의 이유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균등한 참여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저소득계층과 소수집단의 지원에 중심가치가 있으며 지역의 소통과 사회정의 실현의 목표를 실천하고 있다.
미국의 노스캐롤리나(North Carolina) 공동체 정원은 비만예방 프로그램(Growing Healthy Kids)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의 비만 예방을 지원하는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며 전문정원가의 자문과 정원가꾸기 기술지원으로 정원활동과 건강한 음식 선택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아동 비만 예방에 공동체 정원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5년에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동체정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제도권 안에서 지원·확대하고 있다. 비단 산림청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마을가꾸기 또는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공동체정원을 활용한다. 초반의 정책이 정원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인프라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가꾸는 ‘과정’에서의 ‘소통’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우울감, 고독감, 스트레스 등 사회적 질병이 이제 나, 내 이웃, 내 친구가 겪을 수 있는 감기와도 같은 요즘, 공동체 정원에서 소통과 공유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진혜영 국립수목원 정원연구센터장·태화강정원박람회 조직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