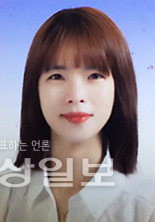
이솝우화 중 하나인 ‘양치기 소년’은 이솝우화 주인공들 중 ‘탑 5’에 드는 인물이다. 우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한 마을에 양을 치는 소년이 있었다. 심심했던 소년은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장난을 쳤다. 늑대가 나타났다며 고함을 질러 동네 사람들을 소년의 홈그라운드로 모으는 소란을 일으켰다. 소년의 거듭된 거짓말에 지친 동네 사람들은 소년이 있는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소년이 그간 내뱉은 거짓말 때문에 늑대가 왔다고 소리쳐도 동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결국 소년의 양은 늑대로부터 모두 죽임을 당했다.
거짓말이 낳은 참사를 보여주는 우화이다. 어린 시절에는 양치기 소년을 비난했었다. 어른이 되어 양치기 소년을 다시 만났을 때는 양치기 소년의 심정을 다소 이해하게 되었다. 필자가 이해하게 된 여정을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양치기 소년에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소년’이라는 단어이다. ‘소년’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사내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양치기 소년은 대략 10대 중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 시대 기준에서 양을 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지만, 이솝우화가 쓰인 시대상을 고려해보면 아이들의 노동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 우화를 필자가 방점을 찍고 싶은 건 ‘십 대 중반쯤 되는 소년이 혼자서 대부분의 시간을 말도 안 통하는 양들과 함께 보낸다’라는 사실이다. 심지어 근처에 늑대도 있다. 나도 나이를 꽤 먹은 어른이지만 늑대가 도사리는 장소에서 양을 치는 일이 맡겨진다면 한동안은 밤잠을 설칠 것 같다. 양치기 소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해답을 얻기 위해서 잠시나마 양치기 소년에 빙의하여 소년의 입장을 밝혀보겠다.
“나는 양치기 소년이다. 처음에 이 일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빠에게 들었을 때 너무나 설레었다. 왜냐하면 아빠가 양을 칠 때마다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진정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팡이를 들고 양을 치는 아빠의 모습은 천하를 호위하는 장군 같았다. 다음날 두근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이른 아침 아빠와 함께 양을 치러 갔다. 가까이에서 본 양들은 눈빛부터 사나웠다. 양들은 내가 여태까지 본 짐승 중에 가장 호전적인 녀석들이다. 겁이 났지만 내 키보다 큰 지팡이를 꽉 쥐고 위엄 있는 표정을 지어보였다. 아빠가 알려주신 대로 지팡이를 휘두르며 양들을 몰았다. 양들은 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몰려갔다. 몰려가는 방향이 숲으로 우거진 방향이라서 늑대가 나올까봐 덜컥 겁이 났다. 우여곡절 끝에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여 안전하게 모든 양들을 가두었다. 눈물이 터졌다. 이런 날들이 새털 같이 많을 거라는 생각과 더불어 혼자서 나날을 견뎌야 한다는 두려움이 몰려오자 지팡이가 꼴 보기 싫었다. 사람이 지독히 그리웠다. 누구라도 여기 와서 나에게 인사라도 나눴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늑대가 왔다고 하면 누군가라도 여기에 오지 않을까? 그러면 몇 마디라도 나누겠지.’ 상념을 이론에만 묻어둘 수 없었다. 실행을 했다.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몰려왔다. “늑대가 어디 있니?” “저 멀리 가버렸어요.” 거짓말이 거듭되자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 후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아 우리집 양들은 모두 떼죽음을 당했다. 그 후 예비 양치기 소년들은 한 가정의 기둥을 뽑아 후려친 나의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게 되었다. 나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변명을 하자면 나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었을 뿐이다.”
필자의 시각으로 본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사람이 그리운 아이였다. 양 떼를 길러 몰고 다니는 장소는 대게 인적이 드문 곳이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 가에서 나와 양 떼를 지켜보는 늑대가 우글거리는 곳이다. 아이가 느끼는 심심함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고 그 그리움의 기저에는 늑대의 공격에 대한 공포와 양을 지켜야 한다는 절절한 책임감이 아닐까 싶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양치기 소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아이들의 숫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늘었다. 이 아이들이 양치기 소년과 같이 그리움과 두려움으로 몸부림치지 않도록 주변 어른들이 시야를 넓혀 세심하게 살펴보기를 바란다.
이연재 울산행복학교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