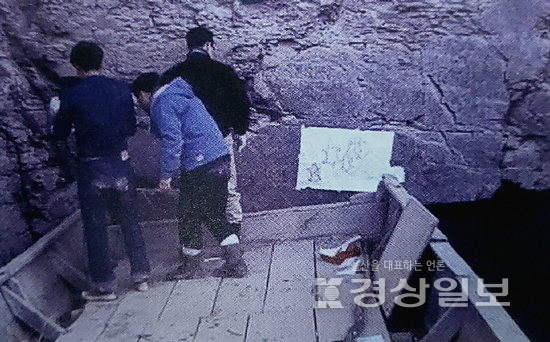

반구대암각화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세계 선사미술학계는 동아시아의 한국에 귀중하고 의미 있는 선사 미술작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널찍한 바위 한 면을 가득 메운 사슴과 고래, 맹수와 사람. 유럽 외의 지역에서 반구대암각화처럼 큰 화면에 바다와 육지의 다양한 생명체가 무리 지어 묘사된 작품이 발견되기는 처음이었다. 고래와 사슴이 한 화면에 새겨진 암각화가 발견되기도 처음이었다.
청동기시대 초기나 신석기시대 후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대화면 미술작품에 세계 선사미술학자들은 경이의 눈길을 보내며 이와 관련된 더 상세한 정보를 접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반구대암각화 실측보고서는 발견된 지 13년이 흐른 1984년에 나왔고, 국내 학자들의 연구는 한동안 여기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다.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은 국내에 암각화학이 연구 분야의 하나로 자리 잡고, 선사미술 연구가 본격화될 수 있게 할 유적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후 암각화 연구의 문은 열렸지만, 유적의 발견과 보고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했고, 선사미술 연구는 독립된 분야로 자리 잡지 못한 채, 일이 년에 한두 편 연구논문이 나오는 정도에 그쳤다. 이런 분야에서 성과를 쌓아가는 연구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어떤 한 분야가 자리 잡으려면 사회적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문학을 교양적 지식 정도로 여기고, 문화와 예술을 주요 행사를 빛내는 장식품으로 인식하는 사회에서 선사미술 연구나 암각화학 같은 기초학문이 한 분야로 자리 잡을 공간은 없다.
선사미술 작품이나 이와 관련된 지식을 무한한 개발 가능성을 담은 문화유산 콘텐츠로 여기기보다는 디자인용 참고자료 정도로 평가한다.
선사미술이나 암각화 연구가 설 자리가 없다면 국내에서 국보로 지정된 반구대암각화나 천전리 각석에 눈길을 줄 연구자가 더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반구대암각화와 같이 유례없는 대형 선사미술 작품이라도 해외의 관심 있는 연구자의 연구 자료로 남을 수밖에 없다.
반구대암각화 발견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로 빛내야 하겠지만, 몇 안 되는 선사미술 및 암각화 연구자들이 연구의 의미와 가치를 되뇌며 보다 심화된 연구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도 제공해야 한다. 2021년은 반구대암각화를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눈길을 주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반구대암각화 발견 50주년 행사가 문화 울산, 에코 울산이라는 새 시대의 표어에 걸맞게 준비되어 시민 모두의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전호태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울산대 반구대암각화 유적 보존연구소 소장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