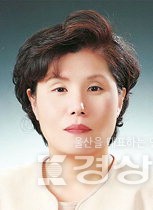
중국의 고대 산학서인 <구장산술>의 제 9장이 ‘구고’장이다. 구고에서 ‘구(勾)’는 사람의 종아리를 의미하며 , ‘고(股)’는 사람의 넓적다리를 가리키는 한자이다. ‘이를 직각삼각형에 대비해서 직각을 낀 두 변 가운데 짧은 변을 ‘구’, 긴 변을 ‘고’라고 한다. 여기에 빗변을 가리키는 ‘현(弦)’을 더해 ‘구고현’이라고 한다.
<구장산술>과 함께 중국의 가장 오래된 산학서로 <주비산경>이라는 책이 있다. ‘주’는 중국의 주나라를 의미하고 ‘비’는 해시계의 시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주나라 때부터 쓰기 시작한 책으로 본다. 놀랍게도 이 <주비산경>에 ‘직사각형의 절반에서, 만약 구가 3이고 고가 4라면, 대각선의 길이는 5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구고현 정리 즉, 피타고라스 정리의 도형을 이용한 증명이 있다. 천문학서이기도 한 <주비산경>에는 당시 우주관이 나타나 있는데 ‘땅은 네모이고 하늘은 둥글다’라는 기록도 있다. 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둘레를 3(구)이라 하고,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둘레가 4(고)라고 한 것을 볼 때 3, 4, 5를 구고현이라 한 그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을 보는 듯하다.
어쩌면 구고현 정리는 인류가 깨달은 최초의 수학 정리일 수도 있다. 바빌로니아 문화에서도 구고현의 정리를 표현한 점토판이 발견되고, 거의 모든 인류 문화권에서 구고현 정리를 알고 있었음이 보인다. 왜냐하면 재단을 쌓고 건축을 하는데 필수적인 정리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구고현 정리를 만족하는 3, 4, 5 같은 세 쌍의 수를 응용하는데 그쳤는데, 이것을 일반화시켜 증명한 것이 피타고라스이다.
우리나라는 신라시대에 <주비산경>을 배우고 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첨성대는 높이가 10m정도인 건축물이지만, 매우 천문학적인 상징과 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1년의 날수를 상징한 벽돌의 개수, 단의 개수 등이 모두 의미가 있으면서 단아하고 아름다운 곡선미도 있다. 첨성대 기단의 대각선과 높이의 비는 약 4대 5이고, 천장석의 대각선과 기단석의 대각선의 길이의 비는 3대 4이다. 장선영 울산대교수·수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