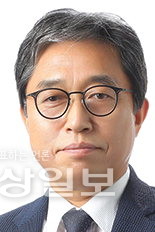
최고 수준의 우정을 의미하는 ‘관포지교(管鮑之交)’는 그와 유사한 ‘문경지교(刎頸之交)’와 깊이를 비교할 때 차원이 다르다. 문경지교도 생사를 함께하는 우정을 의미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서로 간 의리의 조건 즉 쌍무적(雙務的)인 의도가 깔려 있었던 데 비해 관포지교는 가히 완벽했다. 그 우정의 주인공이 춘추시대 관중(管仲)과 포숙(아)(鮑叔牙)이다.
관중이 누구인가? 주군 제 환공(齊桓公)을 도와 중국 역사 최초의 패업을 이루고 강국의 기반을 구축한 불멸의 명재상 관자(管子)다. 공자가 인정한 지도자다“ 관중 아니었다면 우리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왼쪽으로 옷깃을 여미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가 없었으면 오랑캐가 되었을 것 즉 나라를 구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제갈공명도 본인을 관중에 비견하며 롤 모델로 삼은 관중 키즈였다.
이 관자의 존재는 정가(政街)의 친구 포숙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다. 포숙은 환공이 본인을 상경(上卿)에 임명하려 하자 극구 사양했다. 대신에 투옥해 죽이려던 관중을 적극 추천했다. 너그럽게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점, 국가를 다스리는 근본을 잃지 않는 점 등 관중이 본인보다 나은 점 다섯 가지를 열거하며 천하를 위해 관중을 등용해야 함을 역설했다. 관중은 또 포숙에 대해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라고 찬탄한 바 있다. 포숙 때문에 관중이 살았고 관중은 나라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로써 관중은 중국 역사상 천하의 첫 명재상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부국강병의 바이블 ‘관자’로 살아 있다.
관자에 대한 관학의 열기는 공자에 대한 공학의 열기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목민심서>의 목민도 관자 제1편 ‘목민(牧民)’에서 연유된 것이다. 포숙은 본인을 알았고 겸손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정확히 인정하고 추천했다. 그는 실로 이름도 필요 없었으나 친구 관중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름이 남겨진 사람이다. 나라 일을 하다 보니 그런 누구나처럼 이름이 남겨진 포숙이다. 중원의 패자 중국이 있게 된 데는 관중보다도 진정 포숙의 공이 더 크다. 그는 실로 무위(無爲)를 현실 정치사회 속에 실천하고 간 사람이다. 이런 그를 포숙자 또는 포자라고 불러줄 만하다.
남을 위해, 남이 잘 되기를 기도하면 그 효과는 기도해 주는 본인에게 5분의 4가 돌아간다고 했다. 그런데 작금에 우리 사회의 드러난 지도층 인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본인의 생존을 넘어 오직 자기관리, 자기홍보, 자기추천에 몰두하는 이기적 지도자 상들만 보도의 창에 어른거린다. 각자의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채 모두들 자기 기도와 자기 정치에 빠져 거짓말과 파당과 음해와 은폐가 주된 사회적 메뉴로 된지 오래다. 서로 물어뜯는 이전투구식의 실로 슬픈 소인국을 보는 듯하다. 거기에 세인들은 채널을 돌려가며 이들의 작태를 마치 만화나 무협지 보듯 검색하고 서로 나누며 즐기고 있다.
실제 지방 정치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은 그 지역 출신의 부단체장을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자리를 넘볼 가능성 있는 인물을 키우면 안 되기 때문이다. 차기 인력을 키우는 일은 안중에도 없다. 그래서 유능인력일수록 타향에 떠돌아야 하는 것이다. 공직부문 인사를 하는 자들도 ‘인물’을 찾는 게 아니리 ‘지인’을 찾고 있다. 나라 일에 현인을 기용하는 이른바 임인유현(任人唯賢)이 아니라 친한 자를 앉히는 임인유친(任人唯親)을 하고 있다. 도대체 철인·대인·초인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인류환경은 필시 점차 가팔라진다. 이럴수록 우리에게는 관중도 중요하지만 포숙이 더 필요하다. 그의 행적은 노자(老子)의 현묘지덕(玄妙之德) 또는 현덕(玄德)을 실제 역사 속에서 행한 듯하다. <도경(제10장)>에 나오는 현덕은 ‘만물을 성성하게 하는 깊고 미묘한 천지의 이치와 덕’을 의미한다. 즉 낳고 기름에 있어 낳지만 소유하지 않고(生而不有), 일을 행하되 자랑하지 않으며(爲而不恃), 자라게 하지만 지배하려하지 않으니(長而不宰) 이를 일러 ‘현묘지덕·是謂玄德’이라 한다. 불교에서의 이른바 부주상 보시(不住相 布施)의 실천에 해당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기독교 가르침과도 같다. 우리 사회 지도층의 본보기 모습은 2700년 전의 포숙한테서 찾아야 한다.
전충렬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전 울산부시장·행정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