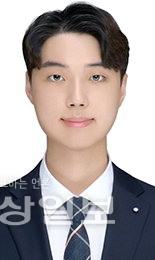
전국이 물에 잠겼다. 며칠 전 쏟아진 폭우로 수십명이 숨지고 실종됐다. 또 축구장 3만4000개 면적의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울산도 예외는 아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일부가 침수됐고, 울주군에는 송수관이 끊기며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도 생겼다.
폭우 이후 기온이 내려야 하지만, 곧바로 폭염특보가 다시 발효됐다. 전문가들은 “폭우에도 육지의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았고, 바다의 높은 수온이 오히려 대기 온도를 다시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즉, 육지와 바다를 가르던 재난의 경계는 이미 사라졌다는 의미다.
취재차 찾은 거제시 멍게 작업장 움직임은 분주했지만, 바닷속에서 올라온 것은 멍게가 아니라 절망이었다. 멍게는 저수온성 생물이다. 하지만 지난해 바닷물 온도가 26℃를 넘으면서 폐사가 줄을 이었다. 어민들은 “올해는 1년 만에 고속으로 키워 출하할 수밖에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기간 거제 등 남해안에서 287어가가 입은 피해액은 약 116억원. 현장 체감 피해는 6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심지어 일부 어민은 “이제는 멍게가 아니라 우리가 익어 죽겠다”고 말한다.
울산도 고수온의 간접 영향권에 놓여있다. 전복은 울산 주요 방류 품종이지만, 고수온 영향으로 최근 생산량이 급감했다.
울산 전복 생산량은 4.03t으로, 전년(9.7t) 대비 58% 줄었다. 해조류 감소로 먹이도 부족한 데다, 수온 상승으로 전복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바다는 더 이상 생명의 터전이 아니라, 생존조차 어려운 공간이 돼가고 있다.
재난의 개념 역시 바뀌고 있다. 과거엔 태풍, 홍수, 적조처럼 특정 시기·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주류였다면, 현재 재난은 전방위적이고 상시적이다. 농민이든 어민이든, 시민이든 산업현장이든 피해자의 이름은 계속 바뀌지만, 위기의 본질은 하나다.
기후위기 속 육지와 바다는 피해가 점점 쌓이며,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소리다.
이대로라면 더 뜨거운 바다, 더 극단적인 폭염·폭우는 당연한 미래가 된다. 문제는 ‘기록적’이라는 단어가 매년 갱신된다는 점이다. ‘역대급 수온’ ‘역대급 폭우’ ‘역대급 피해’ 등 익숙해질수록 위험해지는 단어들이다.
기후위기는 이제 ‘누구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다. 기후위기는 수치를 넘어 삶을 바꾸고 있다. 바다의 위기는 곧 밥상의 위기고, 도시의 침수는 일상의 붕괴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미 오른 온도를 낮출 수 없다고 한다. 이제는 온도 상승폭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과 사회적 연대가 절실한 때다. 오상민 정치경제부 기자 sm5@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