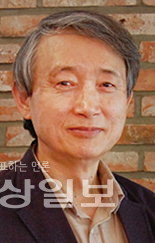
울산은 더 이상 산업만의 도시가 아니다. 이제 교육에서도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유네스코가 주창하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같은 가치를 핵심에 두고 있다. 이 가치를 교육 현장에 실현하고자 울산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 교사 직무연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은 1960년대 산업화를 견인한 중심 도시로, 1997년 광역시 승격을 계기로 국가 경제에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
그러나 문화적 정체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길이 지리적 한계로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극동 한국의 K-컬처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세계인의 문화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1960년대 울산의 산업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 시민의식이었다면, 오늘날 세계시민교육 시대의 성장 동력 역시 시민의식이다.
시민의식을 기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육이다. 세계시민교육은 울산 시민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며, 울산이 ‘문화의 변방’에서 ‘문화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이 제시하는 보편적 가치를 서울이나 부산과는 다른, 울산만의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다.
시인 정현종은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노래했다. 사람은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가장 생생하게 품고 있는 ‘울산의 사람’을 찾는다면, 그 답은 바로 통신사 이예(1373~1445)다.
이예는 태종·세종 시대에 40여차례 일본에 파견돼, 왜구를 억제하고 조선과 일본 사이의 ‘평화’를 일구는 데 헌신했다. ‘인권’은 그가 가장 우선한 가치였다.
왜구에 끌려간 667명의 조선인을 끝내 고국으로 데려온 것은 그가 마지막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울산교육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이예는 또한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 다양성’의 씨를 뿌린 문화 전도사였다. 불교문화를 일본에 전하고, 일본의 수력 물레방아와 사탕수수를 조선에 도입하는 등 양국 간 실용과 문화를 넘나드는 교류를 이끌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를 2005년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한 것은 이 같은 활동 때문이다.
‘문화교류’를 공적으로 문화인물로 선정된 인물은 신라의 혜초와 조선의 이예 두 사람뿐이다.
이예의 삶에는 공감과 연결이라는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역량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어린 시절 왜구에게 잡혀간 어머니를 찾기 위해 일본 땅을 뒤졌던 그는, 개인적 슬픔을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인도주의로 승화시켰다. 그에게 세계시민은 이념이 아니라 삶이었다.
이예의 상징성은 일본에서도 높게 평가받는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일외교의 대표적 인물로 이예와 아메노모리 호슈를 들고, “두 외교관의 공통점은 가까운 이웃나라끼리 교류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통찰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리고 2024년, 일본 교토에는 한반도 출신 인물로서는 유일하게 이예의 동상이 세워졌다.
15세기의 통신사가 21세기의 우리에게 화해와 협력, 상생과 소통의 메시지를 건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울산에는 ‘이예로’가 있다. 이제는 그 상징을 교육의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 아이들은 이예가 걸었던 세계시민의 삶을 배우고, 마을은 함께 체험하며, 그로써 국제사회와 연결되는 교육, 그것이 울산이 만들어 갈 미래다.
바다를 개척하며 소통의 길을 연 600년 전 이예의 정신이 오늘 울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평화, 인권, 다양성은 울산형 세계시민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며,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이예다.
이명훈 고려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