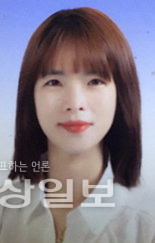
간월산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는 작괘천 너럭바위를 휘감아 노닌 다음 태화강으로 힘차게 흐른다. 작괘천 물줄기를 따라 언양읍에 조성된 산책로는 촌스러움과 세련미가 버무려져 독특한 인상으로 주민들의 발걸음을 사로잡는다. 그중 하나는 개울의 이편과 저편을 잇는 교각이 네모진 콘크리트가 아니라 물줄기를 여러 갈래로 쪼개는 징검다리라는 점이다. 점선으로 연결된 징검다리 돌덩이는 표면이 매끈하고 인절미같이 몽실몽실하게 생겨 징검다리를 건널 때마다 발로 툭툭 치면서 내구성을 살펴보게 하는 충동을 부추긴다.
인적이 드문 시간에 깡충깡충 뛰며 징검다리를 건너다보면 바람에 실린 비릿한 물비린내가 콧가를 뱅글뱅글 돌면서 간질거리고 눈가를 촉촉하게 덮어 온종일 블루 라이트에 고생한 안구를 토닥여 준다. 징검다리 중간에 서서 가만히 물속을 들여다보면 작은 물고기 군단이 찌그러진 동그라미 모양으로 무리 지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고기 군단 대열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휘휘 저으면 물살의 저항과 스쳐 가는 물고기 살결이 손가락 사이에 묵직하며 짜릿한 간지러움을 선사한다.
최근에는 징검다리 앞과 뒤를 그레이딩 하여 연결했다. 징검다리를 건너 등·학교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과 보폭이 좁은 노약자를 배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전보다 징검다리가 주는 스릴감은 다소 떨어졌지만, 변모한 징검다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차가운 돌덩이가 아니라 온기를 품은 돌덩이로 느껴질 정도로 괜스레 마음이 들큰거린다.
다음으로 징검다리에서 벗어나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넓고 편편한 바위(너럭바위)가 개천물 흐름과 관계없이 털썩 주저앉은 것 같은 풍경을 볼 수 있다. 온몸을 펴서 누운 너럭바위의 무사태평에 바삐 흘러가던 물줄기도 잠시 쉬어간다. 너럭바위가 주는 쉼은 언양의 강태공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너럭바위 위에 옹기종기 모여 시간을 낚는 강태공과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마디씩 거드는 타인들 간의 소통에 산책로의 시간은 더디게 간다.
너럭바위 주변을 둘러보면 물가에 이름 모를 철새들이 유유히 노닐고 있다. 철새들은 주민들의 휴대폰에 담겨 박제되지만 나는 굳이 주머니를 뒤적거려 휴대폰을 꺼내지 않는다.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휴대폰으로 아무리 찍어도 눈에 담아 뇌리에 새기는 것에 비해 반짝이지 않음을 알기에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마냥 바라만 보는 편이다. 하지만 기계에 담지 않아 아쉬운 순간은 있었다.
10월 어느 날, 개천에 수달 비슷한 녀석이 나타났다. 물을 침대 삼아 누워 양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던 생물체를 만났을 때 잘 못 본 것 같아 안경을 닦고 눈을 비볐다. 감각의 착오인가 싶었지만, 다행히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내가 봤던 생물체를 같이 보고 있어 환영이 아님을 확인받았다.모두 머리를 맞대고 수달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수달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왜 혼자만 온 건지 등에 관한 질문을 서로에게 답을 기대하지 않고 읊조리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생각지도 못한 수달의 등장에 얼어버려 휴대폰에 담지 못한 천추의 한이 지금도 서린다. 주변인들에게 언양 수달의 존재를 알렸을 때 믿기지 않는다며 증거를 요구하였으나 휴대폰에 담지 않아 절반의 신뢰만 주었다. 내년 10월에는 반드시 휴대폰에 수달을 꾹꾹 담아 내가 본 언양 수달의 존재를 알리고 싶다.
비록 네모반듯한 꽃밭이나 예술가의 고뇌가 담긴 조형물은 없지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촌스러운 언양의 산책로는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갈대와 잡초가 들쑥날쑥 무성히 덮여있는 장소를 지나갈 때는 악어가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마저 들기에 산책할 때마다 기대에 부푼다.
하루 동안 네모난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네모난 책상에 앉아 네모난 모니터를 보며 네모난 키보드를 두드리는 삶에 지친 모든 이들이 언양 산책로를 걸으면서 네모에서 벗어나 자연의 무질서 속에서 편안함을 누렸으면 한다.
이연재 울산행복학교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