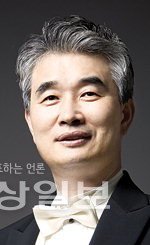
‘그레고리안 찬트’는 로마 카톨릭(Roman Catholic)의 전통적인 전례미사(Missa)에서 사용하던 무반주 단선율 노래이다. 이 노래의 이름이 ‘그레고리안 찬트’여서 그레고리우스(Gregorius) 1세가 작곡한 노래라고 알고 있기도 하지만 그레고리우스1세가 교황으로 재직(590~604)할 당시 각 나라마다 다르게 부르던 성가를 라틴어(Latin)로 통일해서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에 각 지역으로 수사를 보내어 그곳의 성가를 채집하게 하여 정리한 노래들이다.
이 당시 로마 교회에서 주로 불리던 노래는 ‘갈리아(Galia)’ 성가였다. ‘갈리아’는 지금의 유럽이 나라별로 이름이나 지역이 나뉘지 않은 시대인 7세기, 중세시대에 현재 서유럽지역이 거의 포함된 지역을 말한다. 로마 교황청에서 사용되던 ‘갈리아’ 성가는 갈리아 지방에서만 통용되던 노래이기 때문에 갈리아 이외 지역에서는 언어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 교황이 다른 지역을 순방하여 집전할 때 모르는 음악으로 미사(Missa)를 드리게 되는 불편이 있었다. 그래서 지역의 노래를 모아 정리 편찬했고, 이렇게 모은 노래가 무려 3000여곡이 됐다.
악보도 없던 시대에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노래를 채집하기 위해 교황 그레고리우스1세는 ‘칸토르 스콜라(Cantor Schola)’를 설립했다. 이 ‘칸토르 스콜라’는 말 그대로 ‘노래 학교’라는 뜻이다. 여기서 음악 교육을 강화하여 악보도 없이 구전으로 채집한 그 많은 노래들을 암기하도록 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익히는 기간이 무려 9년이나 걸렸고 교육받은 ‘칸토르’들은 전 유럽교회에 파송하여 각 나라의 교회들이 따라 부르게 했다.
마침내 성가의 일관성이나 내용이 같아져서 편리하게 됐고 이 효과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됐다. 그 중 로마 교황청이 바라던 가장 좋은 효과는 각 지역으로 흩어져있던 교회의 세력들이 교황을 중심으로 뭉쳐 로마 교황청의 중앙집권이 가능하게 됐다. 그레고리안 찬트가 이러한 카톨릭 교황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게 해준 효과보다 더욱 큰 역할을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모든 음악의 출발, 시작점이라는 역할이다.
#추천음악=Gregorian Chant. Pater Noster
구천 울산대 객원교수·전 국립합창단 예술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