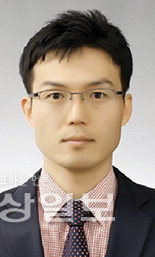
우리는 타인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생기는 피로도가 적지 않다. 무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공원묘지조차 장소가 모자라 여러 차례 확장할 정도로 우리는 죽어서도 옆 사람과 아웅다웅하는 운명인가 보다. 한국 사회에서 대인관계, 사회성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직장인에게 직장 동료와 거래처 사람이 있듯이 교사에게는 학생, 학부모, 동료 교직원이 존재한다. 사람 대(對) 사람으로 얽혀있으며 모든 문제의 시작과 해결책 상당수가 대인관계이다. 그래서 요즘 교사들은 예전과는 달리 ‘대인관계 전문가’ 역량을 요구받는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는가.
교장, 교감의 대인관계 고충을 살펴보자. 학교를 둘러보고, 교실을 살펴보며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관리자로서 당연한 임무지만 돌아오는 것은 ‘감시’ ‘갑질’ 논란이다. 어떤 교사가 교장으로부터 업무 미숙을 지적 받거나 질타를 받아서 운다? 사람들은 원인 제공자에게 관심 없고 ‘힘 없는 교사를 괴롭히는 못된 교감, 교장’ 스토리를 원한다.
부장교사는 업무와 대인관계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다. 온갖 회의와 위원회에 참가하느라 머리 아픈 상황에서 부장교사끼리 업무로 부딪히면 난처해진다. 이겨봤자 반격이 두렵고, 지면 일거리가 늘어나니 당혹스럽다. 학년부장 입장에서는 담임이 자기 반 입장만 내세우며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 울컥한다.
담임교사는 학생과의 대인관계로 힘들어한다. 교실 한 칸에 30명이 몰려있는데 어찌 사고가 안 터지겠는가. 힘들다고 하소연 하고 싶어도 무능력한 담임으로 보일까봐 속으로 참는다.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인 뒤죽박죽 사건이 생기면 짜증이 난다. 학생들 사이에도 돈, 사랑, 폭력이 지저분하게 얽힌 치정 사건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방법을 사용해보면 어떨까?
첫째, 법이 촘촘해진 시대라 업무가 줄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자. 공문 없는 금요일을 만들어봤자 공문 폭탄 월요일이 등장하는 등 조삼모사였다. 상대방의 업무가 많다는 걸 알아주고, 내 업무 또한 많다는 걸 인정받아서 상호배려를 시도해보자.
둘째, 말과 행동을 곱게 가다듬자. 말투가 억세거나 툭툭 내뱉는 사람, 미소에 인색한 사람, 미간을 자주 찌푸리는 사람은 결국 반감을 사게 된다.
셋째, 내 시야에 갇혀서 내 주장만 하지는 말자. 담임 눈에는 자기 반이 보이고, 학년부장은 자기 학년이 주로 눈에 보인다. 학생부장은 전교생이 눈에 들어오며, 교장과 교감은 전교생과 전교사가 눈에 들어온다. 직책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여 대인관계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2022년이 되기를 빌어본다.
김경모 현대청운중 교사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