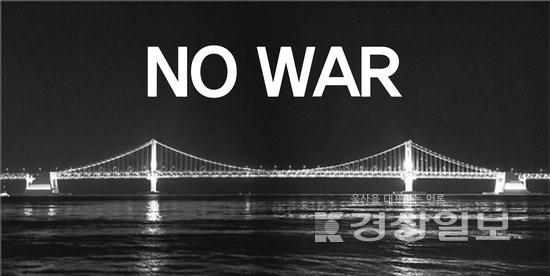
사실, 필자는 ‘경제옹알이’ 원고를 미리 쓰고 여유분도 준비한다. 다만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나가는 이번 글은 마감 직전에 쓸 계획이었다. 시시각각 상황이 변했고, 마지막 정보까지 반영하고자 했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전쟁같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할 후보를 위한 글을 쓸 계획이었다. 승패가 결정되면 승리한 후보를 위한 글은 충분할 것이기에, 결과가 정해지기 전 낙선한 후보를 위한 글을 적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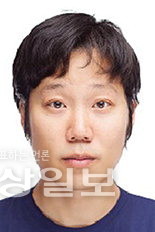
전쟁은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폭력이다. 그리고 그 폭력이 국가의 정치적 선택과정과 무관한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것은 더욱 나쁘다. 부모가 되어서인지, 대피소에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 그저 안타깝다.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전쟁을 없앨 수 없더라도, 꼭 내야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글의 첫머리에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던졌다. 관련 없지만 엮어서 전쟁반대 목소리를 한 마디라도 더 듣게 하려고 한다.
사실 긴 글을 쓰는 것보다 그냥 지면 전체를 ‘NO WAR’라는 다섯 글자로 채우고자 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시도가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경상일보 담당자에게도 이야기해 보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시대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틀을 깨지 못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누군가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전쟁반대 목소리를 낸다고 전쟁이 바로 멈추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맞다. 쓸데없이 일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냥 내 일만 잘 해도 되는데 말이다.
하지만, 내 아이들이 전쟁으로 대피소에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를 생각했다. 그러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전쟁에는,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전쟁에는 반대해야 했다. ‘For your tomorrow, we gave our today’라는 말이 있다. 제 1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군인들을 위한 추모비에 적혀 있는 말이다. 처음엔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당신들의 미래를 위해, 죽는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한국전쟁에서도 UN군을 위해 같은 추모의 글을 올렸고, 혜택을 받은 나는 고맙다고 생각했지만, 이해하지는 못했다.
국가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폭력적이다. 그리고 폭력은 효과적이다. 상대방이 내 뜻을 따르게 하는 강제적인 힘이 있다. 국가가 그 폭력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전쟁이다. 전쟁에서 국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라는 행위를 강제한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 군대라는 폭력적 조직에 속해 있을 때, 느꼈던 것은 막막함이었다. 국가가 나에게 가하는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탈영은 답이 아니었다. 그냥 국가가 가하는 폭력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제대를 하고, 내가 밤에 편하게 잘 수 있는 이유는 밤새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군 복무를 하는 장병들에겐 고마웠다. 다만 내 몫은 했다고도 생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했다. 군대에 있을 때, 애국심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을 강요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주입시키는 사상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대피소에 있는 아이들 사진을 보고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 다시 입대를 한다는 결정을, 정말 하기 싫지만, 그리고 아마도 다양한 이유를 들며 하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건 내 아이들 때문이었다.
나는 전쟁에 반대한다. 그리고 전 인류가 추구해야할 공통적인 목표이자 가치를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전쟁반대라고 생각한다. 철이 없는 이상주의자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길게 보고, 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할 지도 모른다. 전쟁이 국제법상, 그리고 국제평화를 위하는 사상 등에 위배된다는 방식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피소에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전쟁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 지적 허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그랬다.
국가라는 거대한 폭력적 존재 앞에서, 그리고 거대한 폭력적 존재들 간의 힘의 대결인 전쟁에서 개인은 체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속한 국가조차도 폭력적인데, 내가 속하지 않은 국가가 더 많은 폭력의 총량을 실행하고 있다면, 아마도 절망적일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다. 전쟁이 내가 속한 국가에서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내가 모든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전쟁을 보는 시선에는 그런 체념적 방식의 생각이 많이 녹아있다는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는 전쟁이 가지는 그 비이성적인 폭력성 보다는,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는지에, 그리고 경제적 결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비난받지 않는다. 강대국이 벌이는 전쟁에 당신이 반대하면, 전 국민이 경제적 후폭풍을 겪을 수도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느냐는 시선이 보태지기도 한다.
사람이 죽기도 하는 다른 문제에 대해 경제적 손익을 먼저 이야기하면, 피도 눈물도 없다는 비난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전략이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직접적으로 죽음을 강제하는 전쟁에는, 그런 비난이 효과가 적다. 다른 사회적 문제였다면 중요했을, 죽음을 강제하는 직접적 행위가, 범죄로 인식조차 잘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관심은 전쟁의 승패와 그 경제적 결과다. 국가에 의한 살인은 그저 죽은 자의 몫이고, 슬픈 일이지만 전쟁의 승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전쟁만큼 전체주의적 사고가 절대적 지지를 받는 분야는 없다. 나와 관련된 전쟁이 아니라면 말이다.
하지만 아니다. 잘못됐다. 반대해야 한다. 내 아이들이 전쟁으로 대피소에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를 생각해보면 되는 문제다. 국가의 일방적인 폭력이 내 아이들에게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 아이들에게 전쟁이라는 폭력을 가하는 것이 국가라는 존재라면 국가는 필요 없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만큼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는 말이다. NO WAR.
유동우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