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러스감염으로 온 세계가 비상상황에 처해졌을 때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관심 밖의 세상에 있었다. 최지선 작가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예술작업에 대한 허무함과 함께 생산적이지 못한 인간이 된 것 같은 자괴감에 빠졌다. 전시장 문이 닫혔지만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 작가는 사회가 정의하는 생산적인 가치에 부합하려면 어떤 예술작업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손이 찍힌 2점의 작품. 얼핏 조각 작품 같아 보인다. 면면이 따지자면 사진을 부조로 만든 작품이다. 10호가 될 듯 말듯 작은 액자 속에 배경하나 없는 흰 바탕에 손 하나가 서 있다. 무수히 많은 손이라고 해야 맞을까. 같은 이미지가 조금씩 다른 사이즈로 잘려진 엄청나게 많은 출력물이 한 화면에 겹쳐져 있다. 손을 무시하지 말라하더니, 무시할 수 없는 힘이 화면에 존재한다. 사진작업이라 하기에 신선하게 보는 재미와 함께, 기계로 각도를 주어 한꺼번에 썰린 것인지 손으로 한 장 한 장 자른 건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자른 간격이 미세하게 다른 걸 봐서는 손작업이 분명하다. 포착된 이미지가 한 장이 아닌 수백 장으로 출력되어 자르고 붙여지는 수백 번의 반복된 행위가 더해진다. 행위의 시간들이 더해지면서 작가는 한 겹으로는 보지 못했던 다른 이미지와 갖가지 생각들을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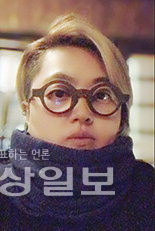
출력된 이미지 위에서의 행위와 시간들이 확연히 드러나는 작업의 방식은 결과중심적인 가치에 역행하는 행위의 시도라고 말한다. 사실 한 장의 사진작품을 건지기 위해 사진작가들은 무수히 많은 시간 셔터를 누른다. 대상을 묘사하는 한 장의 이미지가 전시장에 걸려 있다고 해서 결과중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작가는 사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하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지난 3년간 너무나 무기력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내면에 담아둘 수밖에 없었던 폭발적인 시도들이 여기저기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최지선의 ‘비생산의 생산’은 오는 22일까지 소금나루 작은미술관(울산시 북구 중리11길2 1층)에서 전시된다. 다음 행보는 24일~11월19일 부산502 쿤스트독에서 초대개인전이다.
기라영 화가·미술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