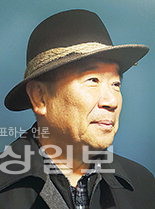
거창 동계(桐溪) 집안을 오랫동안 지켜온 최희 여사가 97세로 타계했다.
필자가 울산에서 먼 거리인 거창에서 타계한 최 여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울산 최초 여류시인 구소(九簫) 이호경(李頀卿)의 거창 삶과 문학 활동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최 여사는 구소 손자며느리다. 최 여사는 우리나라 최고 명문인 경주 최씨 최준 손녀로 거창 동계 집안에 시집갔다. 동계 집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소문난 양반 집안이다. 동계 정온(鄭溫)은 광해군이 동생 영창군을 강화도로 귀양 보내 죽게 한 후 영창군 어머니 인목대비까지 유폐시키자 이를 비난하다가 제주도까지 유배 갔던 영남을 대표하는 선비였다. 최 여사는 동계의 14대손인 정우순(鄭禹淳)에게 시집갔다.
이에 앞서 구소는 정우순 조부 정태균(鄭泰均) 승지에게 재가 했다. 언양에서 태어났던 구소는 추전(秋田) 김홍조(金弘祚) 소실로 울산에 살면서 한시 공부를 열심히 해 이 무렵 전국에서 알아주는 한시 작가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집간 지 8년 만에 추전이 타계하자 거창으로 재가한 것이다.
최 여사는 결혼 전부터 구소와 인연을 가져 최 여사가 우순과 결혼할 때 거창에서 경주까지 선을 보러왔던 사람이 구소였다. 최 여사는 손자며느리가 된 후 구소를 알뜰히 모셨다. 필자가 최 여사를 알게 된 것은 2014년 구소 일대기를 신문에 연재하면서 취재차 최 여사가 살고 있던 동계 집을 자주 드나들면서였다.
구소는 100살까지 살았지만 이때는 이미 작고한 뒤였다. 그러나 최 여사는 필자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구소 할머니처럼 인물도 예쁘고 글도 잘하는 여자가 왜 정실 아닌 소실로 추전에게 시집갔는지 알 수 없다”면서 오히려 구소의 울산 삶을 궁금해 하면서 필자에게 자주 물었다. 최 여사를 자주 만나다 보니 그가 단순히 구소 손자며느리가 아니고 구소 문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존경하는 문학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소는 거창에서 50여년 살았지만 재가 후에는 주위 사람에게 거창에 오기 전 울산에서 펼쳤던 문학 활동을 알리지 않았던 것 같다. 심지어 최 여사까지도 “제가 구소 할머니가 문장이 좋고 서체가 뛰어난 것을 안 건 정태균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였다”고 말했다. 최 여사에 따르면 정태균 할아버지가 돌아간 후 제문을 구소가 직접 썼는데 이때 문장이 좋고 서체가 뛰어나 문중 사람은 물론이고 장례식장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가 놀랐다고 한다. 이후 제문은 최 여사가 보관 필자가 갈 때마다 보여주었다.
구소가 울산 문단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울산 문인은 울산 문단사 시작이 범곡 김태근과 아동문학가 김종한 그리고 김어수 선생이 한국문인협회 가입을 위해 힘썼던 1960년대 중후반으로 보고 있지만 이보다 앞서 문학 활동을 한 인물이 구소와 송년(松年) 오무근(吳武根)이다. 일제강점기 이미 구소와 송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사(詩社)였던 ‘신해음사’ 회원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 당시 신해음사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인이었던 만해 한용운, 육당 최남선이 회원으로 있었다.
1960·1970년대 언양에서 야당 운동을 열심히 벌였던 오민근의 형인 송년은 일제강점기 여학생 야학 설립에 힘썼다. 그의 흔적은 지금도 작천정 앞 바위에 남아 있다. 작천정 앞 큰 바위에는 김좌성, 김홍수, 이재락, 박병호 이름과 함께 송년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중 김좌성, 김홍수는 울산을 대표하는 거부였고 이재락은 울산을 대표하는 유림이었다. 박병호는 동아일보 기자로 일제 탄압에 항거하면서 주민계몽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다.
2012년 구소 시를 모아 <봉선화> 작품집을 내었던 박영민 작가는 구소의 신해음사 활동과 관련 “구소가 신해음사에 시를 투고할 때는 이미 작가로서 시 의식을 형성해 가던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구소에 대해서는 아직 듣고 싶은 얘기와 남겨야 할 글도 많은데 울산 문단사를 그나마 증언할 수 있는 인물이 이렇게 떠나는 것아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장성운 울주문화원지역사 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