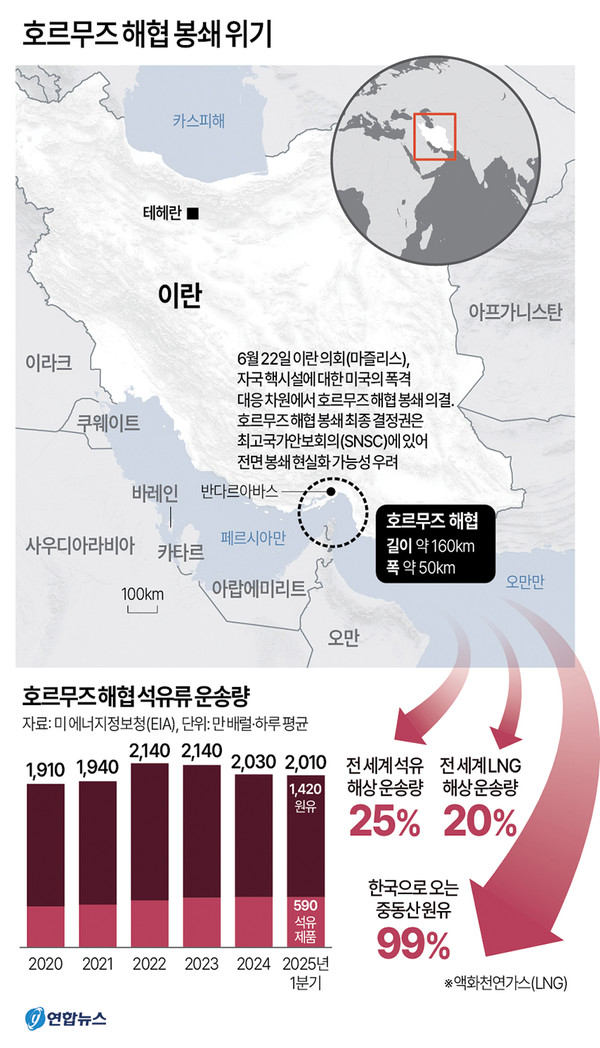
이란 의회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의로 원유·화학 수송의존도가 높은 울산항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울산항의 경우 직접적 물동량 감소는 크지 않지만, 유조선 입항 지연과 해상운임·보험료 인상 등 간접 피해 가능성은 현실화되고 있다.
23일 울산 지역 항만 물류업계에 따르면, 울산항은 동남아·중국 항로 중심의 컨테이너 물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일차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유사 전용부두와 유조선 터미널, 민간 저장시설이 항만 곳곳에 밀집해 있는 만큼 지역 사회에 간접적인 충격은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울산항은 SK이노베이션, S-OIL, 코리아에너지터미널 등이 운영하는 대형 탱크터미널이 집적돼 있다. 특히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유종 블렌딩과 저장 중심의 물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유조선 회전률 저하가 치명적이다.
울산항만물류협회 관계자는 “유조선 입항 지연이나 해상보험료 인상, 운임 급등 등은 지역 정유·화학업계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실제 봉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다른 경제에 미치는 연쇄적 파장이 더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우려했다.
울산항은 과거에도 유사한 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양국은 상대국 유조선에 기뢰와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 미국은 쿠웨이트 유조선을 군함으로 호위하는 ‘Earnest Will’ 작전을 시행했다. 당시 아시아 주요 항만들은 해운 보험료 폭등과 기항 회피로 물동량이 급감했다.
2019년에도 미군 무인기 격추, 유조선 피격 등 긴장 고조 국면에서 한국은 비축유 확보와 선박 재배치로 물량 감소를 최소화했지만, 해상운임과 유류 수급 리스크는 크게 증가했다.
이번 사태는 이란의 실질적 봉쇄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압박 카드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호르무즈 봉쇄는 이란의 자살행위”라고 공개 경고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유가 불안과 글로벌 해운 리스크를 자극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큰 변화는 없다”면서도 “울산항 물동량 변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에 들어갔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23일 사장 주재로 석유위기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중동정세 악화에 따른 석유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석유공사는 정부의 석유수급 위기 대응 체계에 맞춰 ‘석유위기대응 상황반’을 가동 중이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부 및 민간을 합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권고기준인 90일분을 상회하는 총 206.9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석유공사는 전국 9개 비축기지에 총 116.5일분의 정부비축유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석유공사는 중동산유국의 국영석유사를 포함 다수의 국제공동비축 계약(총 2313만 배럴)을 맺고 있으며 원유 수급 불안 등 국가 에너지 위기 발생 시 최대 계약물량까지 우선구매권 행사를 통해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