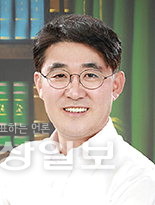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 한다. 사람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총명한 세종마저 기우제를 지내고 측우기를 발명해야 했다. 천수답에 벼농사를 지어 본 사람들은 알리라. 쩍 갈라진 논 바닥과 타 들어가는 벼. 보릿고개를 넘겨야 했던 시절 판례를 보면 수리조합과 물의 이용에 관한 다툼이 수두룩하다. 국가는 물의 이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수자원공사를 설립했다. 소양강댐, 안동댐, 팔당댐 등의 국책 댐 건설사업과 4대강 정비는 모두 수자원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수질의 확보도 중요하다. 페놀 사태 때를 돌이켜 보자. 낙동강 상류가 유해물질로 오염되자 이를 식수원으로 하는 대구와 부산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았다. 취수구 위치에 관해 경북과 대구·부산간에 갈등하고 있고, 스위스 베른이나 독일의 뮌헨 등에서는 맑은 강에서 시민들이 수영을 하고 있다. 우리도 태화강 등에서 수영대회를 여는 것을 보면 강의 건강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 만년설의 히말라야, 알프스, 안데스 지역에는 빙하 녹는 물을 이용하고, 서안해양성이나 몬순 지역은 빗물을 지하수나 표면수로 살아 간다. 물의 오염 예방과 건강성 회복은 시민의 목숨이 걸린 것임을 잊지 말자.
최근 독일이나 일본 등을 중심으로 빗물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돗물은 먼 거리를 관로를 통해 가정으로 운반된다. 최근 수도관에서 이물질이 나와 뉴스가 된 것처럼 노후화된 수도관은 물도 새지만 수질 저하로 골치꺼리다. 생수의 판매량은 늘어만 가는데, 대안으로 빗물을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공기가 미세먼지로 오염되어 있지만, 빗물을 정화하는 기구들이 발명되고 있어 빗물의 이용은 경제적이다.
최근 물 폭탄이 강타해 여러 곳이 물바다가 되었고 물난리 복구에 아우성이다. 알량한 과학 맹신으로 오만한 사람들이 강남역 주변 저지대와 우면산 자락에 아파트와 빌딩을 세웠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600년 전 서울을 조선의 도읍으로 정할 때 배수가 좋은 북한산 자락을 선정한 지혜도, 10년 전 강남역 주변의 쓰라린 물바다 경험도 예방적 백신이 되지 못했다. 안타까운 목숨들과 아까운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전문가들은 기상이변 때문에 어떤 곳은 폭우가 쏟아지고, 다른 곳은 무더위가 온다면서 탄소중립이 필요하다고 목에 핏대를 올린다. 하지만 공염불이다. 사람들은 지구촌과 인류의 미래보다 눈앞의 밥 한 그릇이나 빵 한 조각에 매몰되어 있다. 인공위성이 실시간으로 비구름의 이동을 중개하는 현대에도 원시적 물난리를 겪는다. 무모한 것인가 우매한 것인가.
물난리를 겪으면서 사후약방문으로 해결책을 찾는다. 먼저 배수의 문제다. 하수구의 발명은 수 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전인 인더스문명의 하라파 유적이나 로마의 폼페이 유적에도 정교한 배수구와 하수구가 있었다. 하수 원리는 고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중국의 우(禹)임금은 치수를 잘해 하(河)나라를 창시했다. 우임금은 곤과는 반대로 뚝만 쌓지 아니하고 지형에 맞게 물길을 트는 방식을 채용했다고 한다. 순리라는 말을 물길에서 나왔다.
수량 유입의 저지나 지연도 중요하다. 전국의 80여 개의 댐,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대형저류시설, 지자체별로 만든 저류조(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 등은 물의 유입방지 역할을 한다. 이것들 외에 아파트와 빌딩 옥상마다 빗물의 저류시설을 설치하면 어떨까? 아스팔트는 불투수(不透水)이니 대로변이 아닌 곳은 투수되는 재료로 길을 만들면 어떨까? 논의 홍수조절 효과를 변용해보자. 지금은 한국인의 천재적 능력을 발휘할 때다. 정치(政治)는 치수(治水)로부터 시작됐다.
전상귀 법무법인현재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