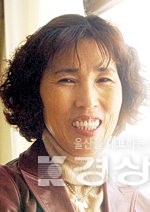
빙산, 빙계계곡, 빙계리, 빙혈등 온통 얼음을 달고 있는 골짜기는 삼복염천의 오아시스다. 그 곳의 주인은 당연히 빙산사지 오층석탑이다.
빙산사지를 가기 전에 국보77호인 의성 탑리 오층석탑이 항상 먼저였다. 우리나라 석탑의 시원이라는 탑리 오층석탑은 한참 나를 붙잡아 놓는다. 70년대 한 시절이 멈춰 선 것 같은 탑리의 골목길을 서성이다 장터에서 국밥까지 사 먹는다. 그렇게 한나절을 보내고 태양이 뜨겁게 대지를 달구는 오후에 탑리에서 멀지 않은 빙산사지를 향하곤 했다.
빙산사지는 삼복더위에도 서늘한 기운이 넘쳤다. 묵은 나무들과 언덕배기의 숲이 두터운 그늘을 만들었다. 멀찍이 자리를 잡고 앉아 무심히 빙산사지 오층석탑을 바라보곤 했다. 국보를 충실하게 모방했구나. 그럼 그렇지. 빼어난 탑이 있으면 이웃에 아류의 탑이 있기 마련이지. 얼음과자를 물고 그렇게 건성 보아 넘겼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늘 후회가 따랐다. 좀 더 차분하게 둘러볼 걸 그랬나. 분명 그 만의 개성이 있을 텐데 아둔하게 지나친 것은 아닐까 괜스레 부끄러웠다.

겨울 절터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다. 등뼈까지 다 드러낸 나무들은 한낮의 고요를 매달고 있다. 비로소 찬찬히 그를 마주한다. 오늘은 보물 제327호, 빙산사지 오층석탑을 제대로 알아가는 중이다. 오층이라는 높이는 키 큰 사내의 풍모를 유감없이 드러낸다. 잘 다듬어 쌓아 올린 지붕돌은 모전석탑의 위엄이 서려있다. 안정감 있는 몸돌은 푸근하기까지 하다. 남쪽으로 난 감실에는 햇살이 가득 고인다. 빙계계곡을 향해 앉아 계시던 금동불은 없어졌지만 허리를 깊숙이 굽혀 합장한다. 편견과 오만으로 그 본성을 몰라 본 것을 뉘우친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곡선미가 돋보이는 녹유리사리병을 본 적이 있다. 은빛 뚜껑과 신비로운 녹색의 몸체가 맑게 조화를 이루어 그 앞을 오랫동안 떠날 수 없었다. 그런 사리장치를 천년동안 품었던 빙산사지 오층석탑은 그 자체로 영원한 보배다. 배혜숙 수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