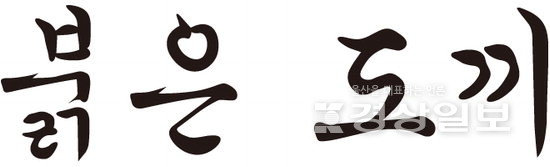
번역작업을 하는 짬짬이 운동도 할 겸 욕실에서 붉은 홍옥석 원석을 페이퍼에 갈았다. 김용삼에게 구입한 돌이었다.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낫을 갈아본 경험이 있어 날을 세우는 방법은 알고 있었다. 양면의 날을 똑같은 방향으로 갈아야만 날카로운 날이 섰다. 방향을 엇갈리게 갈면 아무리 오래 갈아도 날이 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 시간 정도를 갈다가 다시 들어와 번역작업을 하고 노트북 앞에서 온몸이 찌부등할 때면 다시 욕실에 들어가 돌을 갈았다. 그렇게 몇 번을 번갈아하자 저녁 때가 되니 제법 돌에 날이 섰다. 손바닥을 그어보니 살이 베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내가 저녁준비를 위해 주방에서 돼지고기를 썰고 있었다. 나는 갈고 있던 홍옥석을 들고 아내 곁으로 갔다. 붉은 돌로 고기를 썰어보겠다고 했더니 장난을 치는 줄 알고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 아내에게 상황 설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아내는 자리를 비켜주면서도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살다가 돌로 고기를 자른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붉은 돌칼이 비계가 붙은 돼지고기를 깔끔하게 잘랐을 때 아내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날 저녁은 돌칼로 자른 돼지고기를 넣어 끓인 김치찌개를 먹었다.
편안한 하루를 보낸 아내는 기분이 좋은가 보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한 하루가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살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돼지고기를 자른 돌칼에만 신경이 꽂혀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였다. 왜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암각화를 새긴 도구에 대해 연구를 하지 않는 것일까. 돌에다 돌로 쪼아서 그림을 그렸으면 당연히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강한 돌을 사용했을 터인데 그런 사실을 언급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이하우 교수에게는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찾아낸 다음에 이야기 할 작정이었다.

다음날 아침을 먹고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섰다. 아내는 내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겠다고 했다. 나는 반구대를 중심으로 주변의 지형을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돌아다닐 작정이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김일환이란 사람이 일본인 순사 마츠오와 김재성 노인에게 서석곡의 서석문양을 설명한 부분이었다. 김재성 노인이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적은 것이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어 보였다. 정말 서석곡을 중심으로 다섯 개 마을이 어떻게 교류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반곡 마을이었다. 김용삼의 집이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오백 미터쯤 올라가면 반곡지석묘군이 있어 옛적에도 사람이 살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백운산에서 발원한 개울이 반곡 마을을 흘러 대곡천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지도에도 반곡천 표시가 되어있었다. 그런데 지도에는 반곡천을 따라 내려가는 부분이 중간에서 끊어져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