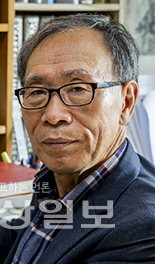
원추리는 전국의 산야에 나는 다년생 화초로 어린잎은 식용하고 뿌리는 한약재로 사용돼 왔다. 7~8월에 피는 등황색 꽃은 긴 꽃줄기가 끝에서 갈라져서 갈라진 나발 모양이 되고, 그것이 예닐곱 개 모여서 떨기를 이룬다.
원추리는 일찍이 <시경> ‘위풍’의 ‘백혜(伯兮>’에서 “어찌하면 원추리를 얻어서, 어머니 주무시는 집 뒤꼍에 심을까?(焉得萱草 言樹之背)”라고 한 이래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을 잊게 하는 상징물로 사용되었다.
이 시구는 <본초강목> ‘훤초(萱草, 원추리)’ 항목의 “새 속잎을 따서 나물을 만들어 먹으면, 풍기가 일어나 취한 것같이 되어 모든 근심을 잊는다. 그래서 망우초라고 한다.”는 설명과 부합한다. 이런 까닭에 옛사람들은 이 식물을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근심을 표현하는 데 자주 활용하였다.

연로해진 얼굴에 창포가 무슨 힘이 되며
마음에서 생긴 근심을 풀이 어찌 잊게 하겠는가?
울타리 둘레에 늦은 국화를 옮겨 심으면 어떨까?
구월에 떨어진 꽃잎을 실컷 맛볼 수 있을 테니.
貌從年老菖何力(모종연로창하력)
憂本心生草豈忘(우본심생초기망)
爭似繞籬移晩菊(쟁사요리이만국)
九秋得落英嘗(구추영득낙영상)
이 시는 신임사화(1721~1722년) 때 강진으로 유배 간 송상기(宋相琦, 1657~1723)가 봄여름의 어름에 작은 화분에 창포와 원추리를 옮겨 심었으나 너무 늦은 탓에 꽃이 피지 않자 지은 칠언절구이다. 석창포는 눈을 맑게 하고 젊음을 지켜 주며 원추리는 근심을 잊게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시인은 노쇠한 얼굴과 마음속 근심을 치유하려고 창포와 원추리를 심지만 그것마저 개화하지 않자 울타리 둘레에 국화를 심어 늦가을에 지는 꽃잎이나 실컷 맛보겠다고 생각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범중 울산대 국어국문학부 명예교수·<알고 보면 반할 꽃시>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