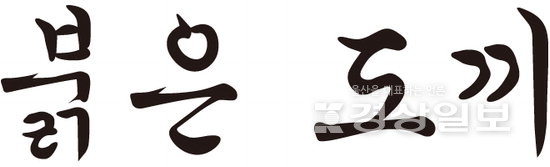
“이건 새로운 발견입니다. 학계에 보고를 해야 해요.”
“보고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걸요.”
나는 유골이 든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김동휘에게 장소가 어떤가 물었다. 덧붙여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 바위벽이 지금 서 있는 곳의 오른쪽 산 끝에 있다는 것을 일러 주었다. 20년 전에 건너편의 버드나무 숲이 우거진 곳을 함께 걸었다는 설명도 해주었다.
“저곳이 바로 최초의 사막이었습니다. 지금은 버드나무 숲이 되었지만 그때는 풀 한 포기 없는 사막 같은 길이었죠. 상류에서 떠내려 온 모래가 저 위에서부터 암각화 앞까지 덮여 있었어요.”
김동휘는 대체로 만족하는 표정이었다. 김은경 시인이 가져온 깔개를 깔고 그 위에 유골함을 올려놓았다. 간단하게 차려온 과일을 앞에 놓고 술을 따라 놓았다. 김동휘가 마지막 이별의 절을 하고 뒤따라 나와 김은경 시인이 함께 절을 했다. 유골함을 열었다. 김동휘가 장갑을 낀 손으로 유골을 한 줌 쥐어 앞 쪽에 뿌렸다. 가벼운 바람에 유골이 흩날렸다. 마치 바람이 K를 암각화로 데려가는 듯 했다.
김은경 시인이 K의 시를 낭송했다. 그토록 사랑을 열망했던 그의 시가 유골과 함께 공중으로 흩어졌다. 수천 년 전에 이곳에서 암각화를 새기던 사람들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 알 것 같았다. 이제 K도 그들이 간 길을 따라 가고 있을 것이다. 암각화에 새긴 고래그림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 K의 시도 수천 년을 이어 내려갈지는 미지수였다.

김은경 시인이 낭송을 마치고나자 김동휘는 손바닥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울음소리는 낮은 겨울바람 소리처럼 바닥에 낮게 깔려 버드나무 숲 속으로 흩어졌다. 울음소리가 길게 이어질수록 그녀의 몸 안에 남아있는 생명의 기운들이 빠져 나가는 것 같았다. 김은경 시인이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울음을 그치게 했다. 이미 떠나간 사람은 기분 좋게 보내드려야 한다는 말에 정신이 퍼뜩 돌아오는 듯했다.
돌아오는 길에 김동휘의 발걸음이 무척 무거워 보였다. 조금 단이 높은 돌을 밟고 올라서는데도 힘들어했다. 김은경 시인이 팔을 잡고 부축해 주었다. 나에게도 은근히 다른 쪽 팔을 잡고 부축해 주었으면 하는 눈길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함부로 그의 팔을 잡을 수 없었다. 방금 K의 유골을 뿌린 팔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방금 남편을 보내고 나서 다른 남자의 팔에 기댄다는 게 용납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슬픔은 당분간 그녀의 몫이었다.
차에 돌아오니 12시였다. 전시회 오픈 시간은 오후 한시였다. 오영수 문학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