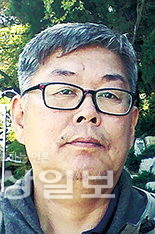
11월 말의 찬바람이 옷소매로, 옷깃으로 파고드는 계절이다. 황량한 들판에는 마시멜로 같은 하얀 ‘곤포 사일리지(梱包 silage)’가 나뒹굴고 있다. 나무에는 마지막 잎새들이 우수수 소리를 내면서 떨어진다.
오동잎 한잎 두잎 떨어지는 가을밤에/ 그 어디서 들려오나 귀뚜라미 우는 소리/ 고요하게 흐르는 밤의 적막을/ 어이해서 너만은 싫다고 울어대나~~.
만추의 낙엽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오동나무 잎이다. 사람 얼굴 만한 잎이 ‘뚝’ 떨어지면 비로소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오동잎’은 197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최헌의 노래다. 지난 22일은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었지만 눈은 안 오고 가을 찬바람에 오동잎만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오동나무의 특징은 빨리 자라고 잎이 크다는 점이다. 15년 쯤 되면 키는 10m를 넘기고 둘레는 한아름이나 된다. 잎은 20~30㎝ 정도로 웬만한 부채만 하다. 오동나무는 나뭇결이 아름다워 가구 목재로 자주 이용했다. 특히 딸이 태어나면 집 근처에 오동나무를 심어 딸이 출가할 때쯤이면 혼수가구를 장만하기도 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관을 짤 때도 쓰였다.
오동나무는 또 거문고, 가야금, 비파 등의 악기를 제작하는데 많이 쓰였다. 악기가 뒤틀리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문신 신흠은 ‘오동나무는 1000년이 지나도 가락를 품고 있다’(桐千年老恒藏曲)고 노래한 바 있다.
오동나무 못지 않게 가을 정서를 대변하는 나무로는 은행나무를 들 수 있다. 이 때 쯤 신문사 앞 가로수 은행나무에서는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은행나무의 ‘은행(銀杏)’은 은(銀) 빛이 나는, 살구(杏)처럼 생긴 열매가 달린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 3억5000만년 전 고생대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찰스 다윈은 은행나무에 ‘살아 있는 화석(living fossil)’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은행나무는 열매를 맺기까지 수십년이 걸리기 때문에 공손수(公孫樹)라고도 한다. 할아버지가 은행을 심으면 손자가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뜻이다.
오동나무나 은행나무의 잎이 완전히 떨어지면 비로소 겨울이다. 오동나무와 은행나무는 벌레가 잘 먹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오동나무는 악기나 가구로 수백년을 살고, 은행나무는 화석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한다. 겨울은 오지만 오동과 은행은 겨울이 두렵지 않다.
이재명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