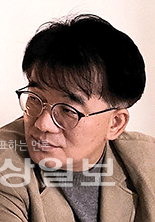
1.
언양천전리성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와 천전리에 걸쳐 있다. 산성산(山城山, 297m)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석성을 축조한 테뫼식 산성이다. 언양천전리산성은 문헌에 기록이 전하고, 현재 흔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있고, 구전하는 이야기 또한 산성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점에서 현전하는 울산의 산성들 가운데에 그 가치가 두드러진다.
산성산(해발 296m)에서 안산(해발 252m)까지 이어지는 구릉 사이의 안골과 북쪽 구릉 말단부 해발 205m에서 100m 선상에 천전리 고분군이 분포한다. 울산에서 고분군과 함께 조성된 산성은 운화리산성이 있다. 두 곳 모두 석재의 종류와 축조 방법이 같다.
거의 같은 시기에 고분과 함께 산성을 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언양천전리산성은 산성 주변에 고분군이 대규모로 축조됐다는 점에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고고학 자료가 된다.
언양천전리성이 있는 지역은 양산단층에 속한다. 양산단층은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시작되어 경상남도 양산시를 지나 부산시 낙동강 하구를 잇는 단층으로 낙동강 하구와 경주를 연결하는 주요한 통로이다. 양산단층은 경주에서 낙동강 하구를 거쳐 외부로 나가기에도 좋지만, 반대로 외부 세력이 경주 또는 경주를 거쳐서 서울로 가기에도 좋은 곳이다.

양산 단층에 자리한 언양지역은 울산에서 밀양으로 연결되는 24번 국도와 경주와 양산을 잇는 35번 국도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교통의 요충지이며, 남동해안에서 울산 지역을 거쳐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군사상 전략적 요충지여서 산성의 필요성이 있는 곳이다. 언양천전리성은 언양읍성과 함께 언양지역의 방어 체제를 구축했던 성으로 고대로부터 주로 왜구의 침략에 대한 방비를 목적으로 쌓은 산성이다.
산성은 대체로 산과 평지가 만나는 자리여야 하고 산속에 넓고 평평한 곳이 있고, 주변에 물을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천전리 지역은 북쪽으로 고헌산(1034.1m)의 지맥이 남으로 뻗어 내려 언양읍과 경계를 이루고, 동쪽으로 화장산(271.6m)과 봉화산(350.2m)이, 서쪽으로 가까이는 신불산(1159.3m) 간월산(1069.1m) 밝얼산(739.2m) 오두산(824.6m)이, 멀리는 가지산(1240.9m)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태화강 상류 지역으로 넓은 충적지여서 농경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천전리의 가운데에 있는 산성산은 높지 않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경사가 심해 서북쪽 한 면을 제외하고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한마디로 산성을 쌓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에 편찬된 <언양읍지>에는 ‘언양천전리성의 둘레가 2000척(尺)이고, 성안에 우물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산성이 방어진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물이 필요한데 언양천전리성은 테뫼식 산성임에도 우물이 존재한 것이다. 성벽은 모두 무너졌으나 성안의 우물터는 아직도 서쪽 편에 잘 남아있다. 성벽은 산기슭에 의지해 바깥쪽으로 수직에 가깝게 3m 가량 쌓아 올려 축조하였고 성벽 위의 폭도 3m 내외이다. 산성 내에는 산성산 정상 부분과 북동쪽 일대에 초석이 남아있어서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성 주변에는 곳곳에 절터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토기 조각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2.
천전리는 상북면에 있는데, 왜 언양천전리성이라고 할까. 언양이라는 지명의 유래를 찾아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천전리는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에는 거지화현에 속했다. <삼국사기> 권34 잡지3 ‘양주조’의 기록과 <고려사> 권57 지리지2 <경상도 울주조>의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고려 현종 때에 지방 제도를 정비하면서 1018년(현종 9)에 헌양현은 울주의 속현이 되어 울산 관할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1143년(인종 21) 헌양현에 감무(監務)가 배치됐다. 감무가 배치된 뒤 어느 시점에 헌양현은 언양현으로 개명됐다. 언양현은 임진왜란으로 인구와 전결(田結)이 격감해 1599년(선조 32)에 경주부와 울산도호부에 나뉘어 편입되어 폐지됐다가, 1612년(광해군 4)에 다시 언양현으로 독립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언양군이 됐는데, 그 영역은 종전과 같았다. 언양군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언양면으로 격하되어 울산군에 소속됐다. 언양천전리성은 지금은 울주군 상북면에 속한 지역이지만, 1914년 이전만 해도 언양군에 속한 지역이었다. 그 이전에는 언양의 옛 이름인 헌양현에 속한 지역이었다.
3.
언양천전리성을 지역 주민들은 과부성이라고 부른다.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부산진성과 동래성을 함락시킨 왜적들의 한 부대가 구포와 양산을 거쳐 언양으로 쳐들어왔다. 경주를 거쳐 서울로 가거나 울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언양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일본 대군을 맞아 작은 읍에 불과한 언양이 제대로 저항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갑작스레 적을 맞이한 등억리를 비롯한 언양천전리성 주변의 명촌리와 길천리, 그리고 천전리의 주민들은 급히 산성으로 들어가서 싸웠다. 미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일본의 대군을 맞아서 맹렬히 저항했으나 모두 죽임을 당했다.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참조)
왜병들이 떠나고 피신했던 마을 부녀들은 아버지와 남편, 동생을 찾아 성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비명을 질렀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가족의 시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례조차 치를 수 없었다. 대신 시체를 옮겨 장사를 지냈다. 이후 마을에는 과부만이 남아서 삶을 유지했다. 이때부터 언양천전리성은 수많은 과부를 만든 성이라는 의미로 ‘과부성’이라고 불리게 됐다.
언양천전리성과 관련한 과부성 이야기는 임진왜란의 역사적 상처가 담긴 지명담이다. 다른 지역의 ‘과부성’ 이야기가 전쟁에 참여한 과부에 초점을 뒀다면, 울산지역의 ‘과부성’은 전쟁의 상처가 남긴 비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송철호 한국지역문화연구원장 문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