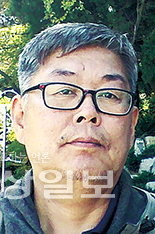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영남알프스에 첫눈이 내렸다. 지난 21일이 절기상 동지였으니 겨울 문턱을 지나도 한참이나 지나온 터다. 필자가 어렸을 적 이 때쯤이면 마을에는 집집마다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군불을 지핀다/ 숨쉬는 집/ 굴뚝 위로 집의 영혼이 날아간다/ 가출(家出)하여, 적막을 어루만지는 연기들/ 적막도 연기도 그러나/ 쉬 집을 떠나진 않는 것/ 나는 깜빡 내/ 들숨 소리를 지피기도 한다.
‘군불을 지피며 1’ 전문(장석남)

군불은 국어사전에 따르면 음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방을 덥히려고 아궁이에 때는 불이다. ‘군불’의 ‘군’은 ‘없어도 되는’ 또는 ‘쓸데 없는’ 등의 뜻이다. ‘군살’은 몸에 붙은 지방 덩어리를, ‘군식구’는 가족 외의 식구(食口)를, ‘군것질’은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을, ‘군더더기’는 쓸데없이 덧붙은 것을, ‘군음식’은 과자·과일 따위의 끼니 외에 먹는 음식을, ‘군소리’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의미한다.
큰 추위가 다가오면 쇠죽이나 밥을 할 때 말고도 아궁이에 불을 때는 경우가 많아진다. 특히 새벽녘 머리맡 자리끼가 설풋 얼라치면 아버지는 얼른 일어나 마굿간으로 들어가 군불을 땠다. 초저녁에 쇠죽을 끓이면서 데운 방바닥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탓이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이불을 끌어당겨 덮어주고는 새벽 일과를 시작했다.
온돌은 ‘방바닥에 불을 때서 구들장을 뜨겁게 난방을 하는 장치’라고 설명돼 있다. ‘구들’이라는 순우리말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신석기 시대 두만강 하구 구들 유적을 살펴보면 최소 5000년은 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구들은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 ‘온돌(溫突)’이란 한자어로 표기되기 시작했다.
아궁이에 불을 때면 구들장이 열을 받으면서 방 전체가 따듯해진다. 구들장에서는 원자들이 진동하면서 좋은 전자파가 나온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아랫목은 평소 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자리였다. 그렇지만 삭풍을 맞으며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면 벌떡 일어나 아랫목을 내주는 것이 우리네 예절이었다.
2024년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비상계엄 소동으로 세상이 온통 얼어붙었다. 구들장 위 아랫목도 체감온도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고 있다. 시계 제로의 세상에 마음만은 얼지 말기를.
이재명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