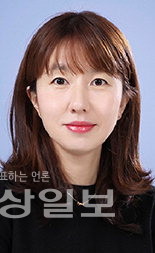
시험 감독을 마치고 답안지를 정리하고 나오다가, 앞자리 앉은 한 학생과 눈이 마주쳐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걸었다.
“오랜만이야. 감독 들어갈 때마다 널 자주 보는 것 같아. 문제 열심히 풀더라. 보기 좋다.”
요즘 학교는 선택과목에 따라 시험 치는 교실이 바뀐다.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의 반에, 우연히 몇 번 감독을 들어갔던 것이다. 그런데 그 학생의 뜻밖의 대답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네! 선생님, 선생님이 감독 들어오신 과목은 시험을 다 잘 본 것 같아요!”
18살 남학생의 대답이 이렇게 다정하다니. 그 아이의 한마디가 마치 내가 행운의 여신이라도 된 것처럼 여겨지게 했다. 그렇게 기분 좋게 교실을 나서는데, 문득 오래전에 읽었던 ‘말 그릇’이라는 책이 떠올랐다. 그 책을 읽을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용이, 그 아이의 한마디를 통해 새삼스럽게 마음에 와닿았다. 아이가 가진 ‘말 그릇’의 크기와 따뜻함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크기에 따라서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가 달라진다. 말 그릇이 큰 사람들은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갈등을 극복하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말을 사용한다. 너와 나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말 그릇’(김윤나) 中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가 어떤 생각을 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가 곧 성장의 방향을 결정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말 그릇’과 ‘생각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다. 즉, 말 그릇이란 표현의 힘이며, 동시에 내면을 드러내는 창이다. 말 그릇은 아이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어떤 태도로 세상에 전하는지를 보여준다. 말 그릇이 넓은 아이는 친구와 다툼이 생겨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풀어 나간다. 또한 발표나 토론 자리에서도 자신감 있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쳐 보인다. 반대로 말 그릇이 좁으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거나 서툰 표현으로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기도 한다.
말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넘어, 마음을 존중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태도를 함께 길러야 한다. 아이가 이야기를 꺼낼 때는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의 눈빛으로 반응하며,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질문을 던져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그렇게 느꼈구나”와 같은 한마디는 아이의 마음을 열고, 그 아이의 말 그릇을 조금씩 자라게 한다.
생각 그릇은 사고의 너비를 뜻한다. 이는 세상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폭을 의미한다. 생각 그릇이 좁으면 단편적인 시각에만 머물고, 그릇이 크면 다양한 시각을 수용하며 한층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한다. 생각 그릇을 키우려면 질문이 필요하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일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와 같은 질문이 아이의 사고를 확장하게 만든다. 또한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점을 배우며 생각의 폭을 넓힌다.
말과 생각은 결국 함께 자라야 한다. 생각만 깊고 표현하지 못하면 세상에 전해지지 않고, 반대로 말만 앞서면 속이 빈 공허한 울림이 된다. 따라서 교육은 아이가 사고를 단단히 키우고, 그것을 품격 있게 나눌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토론이 끝난 후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게 하는 활동은 매우 효과적이다. 사고를 언어로 정리하면서 동시에 표현력과 소통 능력까지 함께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작은 말과 생각의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아이의 말 그릇과 생각 그릇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진다. 결국 세상은 깊이 사고하고 따뜻하게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아이들이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야말로 집과 학교가 함께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길일 것이다.
정지윤 울산 방어진고 교사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