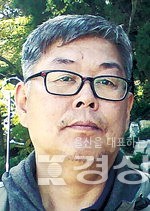
추석 전날 ‘가황’으로 불리는 나훈아가 TV에 출연해 전국민을 열광시켰다. 이날 안방극장을 달군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전국 평균 시청률 29.0%를 기록했다. 필자는 이번 콘서트에서 나훈아가 부른 곡 가운데 ‘홍시’를 가장 좋아한다. 홍시는 추석 즈음에 익는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오면 눈맞을 세라 비가 오면 비젖을 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 세라 사랑 땜에 울먹일 세라~
감은 한글이다. 홍시의 뒷 글자인 시(枾)가 감을 뜻하는 한자다. 붉은 감은 홍시(紅枾), 곶감은 건시(乾枾), 볕에 말리면 백시(白枾), 수분이 많고 맛이 좋으면 수시(水枾)라고 불렀다. 그 중에서도 홍시는 엄마가 아이들의 입에 넣어주는 가장 달고 맛있는 것이었다. 나훈아 역시 홍시를 보면서 효를 생각했으리라.

조선시대 때는 감나무의 5덕(文·武·忠·孝·節)을 칭송했는데 그 중 하나가 효(孝)였다. 치아 없이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조선 인조 때 학자인 권별이 저술한 <해동잡록>을 보면 주세붕과 홍시에 관한 기록이 있다. 풍기 군수로 재직하면서 백운동 서원을 지었던 주세붕은 ‘아버지가 홍시를 즐겼으므로 자기는 종신토록 차마 홍시를 먹지 못했다’고 행장에 기록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유학의 시조인 주세붕 선생의 ‘홍시 효(孝)’는 각별하다고 하겠다.
풍수지탄이라는 말처럼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 바람이 쉴새없이 불고, 자식은 봉양하고 싶어도 어버이는 돌아가시고 없다. 추석을 쇠고 나니 나훈아의 ‘홍시’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톡!/ 가슴이 철렁/ 우주가 떨어진다/ 빠알간 햇홍시 하나/ 제 색깔에 못 이겨,/ 그 우주 맛있게 통째로 삼키는/ 이 가을 … ‘홍시’ 전문(박준영)
요즘의 하늘은 구름 한점 없는 비췻빛이다. 빠알간 햇홍시와 비췻빛의 하늘은 그 자체로 그림이다. 그리고 문득 ‘톡’ 떨어지는 홍시 하나. 시인은 홍시를 우주라고 표현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을 좋아했지만 모두 따지 않고 큰 것 하나 정도는 남겨뒀다. <주역> 박괘(剝卦)에서는 이를 석과불식(碩果不食)이라고 했다. 풀이하면 ‘큰 열매는 먹지 않는다’는 뜻이다.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 두는 까치감이라고나 할까. 홍시 하나 떨어지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우주의 이치에 다름 아니다. 이재명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