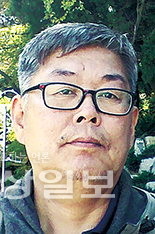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다. 이맘 때가 되면 “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고향이 생각난다. 정지용의 시 ‘향수’는 읽어도 읽어도 가슴이 아리다. 특히나 서리 까마귀는 겨울 초입의 서정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까마귀, 올해도 태화강 대숲에는 수만마리의 까마귀(사진)가 내려왔다. 울산 까마귀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10월 중순이면 찾아오는 반가운 새다. 초창기 4만 마리에서 2017년 7만까지 늘었다가 최근 점차 줄어들고 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다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랴
이 가사는 ‘가요무대’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인데, 알고 보면 김소월이 지은 ‘부모’라는 시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쯤 찬바람이 휭하고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은 부모를 생각한다. 고향 집 아랫목은 따뜻한지, 영하의 날씨에 혹 감기에는 걸리지 않았는지 근심한다.

매년 고향을 찾아오는 까마귀들은 효도하는 새로 유명하다. 진나라에 학식이 깊고 덕망이 높기로 유명했던 이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진나라 무제는 이밀에게 높은 관직을 내렸지만 그는 할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관직을 사양했다. 그는 “한낱 미물인 까마귀도 반포지효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제가 늙으신 할머니를 끝까지 봉양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여기서 반포지효(反哺之孝)라는 사자성어가 만들어졌다. 이 이야기는 이밀이 지은 <진정표(陳情表)>에 실려 있다. 까마귀는 새끼가 부화하면 두 달 동안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는데, 그 까마귀가 자라나면 전과는 반대로 두 달 동안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어 봉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겨울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드높으니 정지용의 ‘향수’가 더욱 가슴에 와닿는다. <한시외전>에 이런 말이 있다.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 고향이란 추울수록 사무치는 곳이다, 풍수지탄( 風樹之嘆)의 한숨처럼.
이재명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