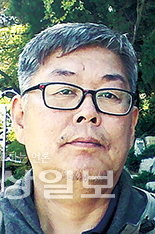
미술시험에 ‘위 사진의 조각 작품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라는 문제가 나왔다. 첫번째 학생은 보자마자 ‘로댕’이라고 적었다. 눈이 나쁜 두번째 학생은 컨닝을 잘못해서 ‘오뎅’이라고 썼다. 세번째 학생은 나름 머리를 굴려 ‘어묵’이라고 적었다. 네번째 학생은 아무래도 비슷한 답을 쓰기가 멋적었는지 ‘덴뿌라’라고 적었단다.
김이 뿌옇게 나는 어묵이 생각나는 계절이다. 필자는 ‘오뎅’이라는 말이 하도 입에 익어 표준어 ‘어묵’이라고 하면 왠지 맛이 덜 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어쨌든 울산에서 어묵하면 부산어묵이 대세이지만 필자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울산중앙시장에 별도의 ‘오뎅공장’이 있었다. 필자의 어머니 등 울산 사람들은 장이 설 때마다 이 공장에서 어묵을 사갔다. 이 어묵은 지금과는 달리 거의 대부분이 도시락 반찬용으로 쓰였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어묵은 ‘생선의 살을 으깨어 소금과 밀가루, 녹말가루 등 부재료를 넣고 뭉친 후 익혀서 묵처럼 만든 음식’으로 나와 있다. 어묵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건너온 것인데, 이 중에서도 어묵꼬치는 정통 ‘오뎅(おでん)’이라고 할 수 있다. 오뎅이라는 이름은 어묵의 원조로 알려진 ‘덴가쿠(でんがく)’를 존칭으로 축약해 부른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お)는 존칭이나 미화를 할 때 쓰이는 접두사이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어묵의 기원은 진나라라고 전해진다. 진시황은 평소에 생선 요리를 즐겨 먹었는데, 만약 생선 요리에서 가시가 발견되면 요리사를 사형시켜버렸다고 한다. 때문에 요리사가 가시를 100% 제거한 생선 요리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다 으깬 생선살로 경단을 만든 요리가 어환(魚丸)의 유래라는 설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숙종때 간행된 <진연의궤>에 어묵이 등장한다.

선거운동 기간에 오뎅 꼬치를 들고/ 사진을 찍지 마라/ 오뎅은 촬영용 소품이 아니다//…//생활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오뎅을/ 어느 한 순간/ 사진 속 값싼 모델로 등장시켜/ 수모를 줄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 ‘오뎅을 존중하라’ 일부(정덕재)
어묵꼬치(오뎅)는 정치인들이 재래시장에서 가장 자주 먹는 음식 중의 하나다. 지금까지 재래시장에서 어묵꼬치를 안 먹어본 대통령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마도 서민적인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총선이 다가오니 벌써부터 선량들이 설쳐댄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이제 오뎅 들고 쇼하는 일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