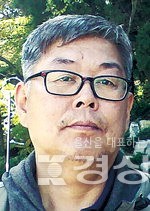
연못가에 새로 핀/ 버들잎을 따서요/ 우표 한 장 붙여서/ 강남으로 보내면/ 작년에 간 제비가/ 푸른 편지 보고요/ 대한 봄이 그리워/ 다시 찾아옵니다
서덕출(1906~1940)의 ‘봄편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동요다. 이 동요에서 제비는 봄을 알리는 전령사다. 강남에 살던 제비는 우표가 붙은 버들잎을 보고 고향 땅을 찾아온다. 이 때가 춘분(春分·3월20일) 무렵이다.
서덕출은 줄곧 태화강 인근에서 살았다. 5살 때 대청마루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됐다. 학교도 가지 못했던 그는 어머니로부터 한글을 배워 동요를 짓기 시작했다. 1925년 아동잡지 <어린이>에 ‘봄편지’가 입선하면서 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이 됐다.
제비는 몸길이 17㎝정도의 작은 새다. 봄에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제비는 4월말 무렵부터 둥지를 지어 연 2회 번식을 한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로 개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제비의 외관상 가장 큰 특징은 턱시도 같은 남성복이다. 두 갈래로 길게 갈라진 이 옷은 주로 성악가들이 입는데, 말 그대로 ‘연미복(燕尾服)’이라고 불린다. 제비 연(燕)에 꼬리 미(尾)를 쓴다.

제비는 민첩함의 대명사다. 최대 속력은 250km 정도 되는데, 곡예비행을 시작하면 눈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제비의 먹이인 날곤충들이 습기가 많아지면 날개가 무거워져 낮게 날기 때문이라고 한다.
춘분(春分)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는 날인 동시에 겨울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춘분을 전후해 농가에서는 봄보리를 갈고 춘경(春耕)을 하며 담도 고치고 들나물을 캐어먹는다.
그렇지만 춘분 무렵에 찾아오는 꽃샘추위는 오는 봄을 돌려놓을 정도로 혹독하다. 그래서 ‘이월 바람에 검은 쇠뿔이 오그라진다’ ‘꽃샘에 설늙은이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도 생겨났다. 그러나 꽃샘추위 속에서도 봄은 기어이 온다.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땅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생명을 만드는 쉬임 없는 작업/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해마다 봄이 오면’ 중에서(조병화)
이재명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