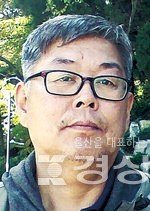
태화강가에 연두색 실버들이 새순을 내밀기 시작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실버들은 꼭 풀어 헤쳐놓은 연두빛 머리카락 같다.
실버들을 천만사 늘어 놓고도/ 가는 봄을 잡지도 못한단 말인가/ 이 내몸이 아무리 아쉽다기로/ 돌아서는 임이야 어이 잡으랴// 한갖되이 실버들 바람에 늙고/ 이내 몸은 시름에 혼자 여위네/ 가을 바람에 풀벌레 슬피울 때엔/ 외론맘에 그대도 잠못 이루리
인순이가 ‘희자매’ 시절 불렀던 ‘실버들’은 김소월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다. 연두빛 실타래를 천만사(千萬絲) 늘어 놓고도 봄을 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사가 가는 세월에 묻어 있다. 실버들은 바람에 늙고 가을 풀벌레 소리는 겨울을 향해 가는데 오늘 밤 이 시름은 또 어쩔건가.
실버들은 가지가 실처럼 가늘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능수버들 또는 수양버들이라고도 부르는데, 고향이 우리나라와 중국이라는 차이 뿐 겉모습은 거의 같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물이나 강가에 주로 자란다. ‘천안삼거리 흥~ 능수야 버들은 흥~’로 시작되는 천안의 능수버들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종이다.
봄이 되면 강변의 버들은 연록색 파스텔톤을 띠면서 봄의 정서를 자극한다. 평양(고려시대 서경)은 예로부터 중국으로 왕래하는 사신들의 주요 통로였으며, 음주가무가 유행한 곳이었다. 평양하면 떠오르는 것이 기생이요 풍류였던 것이다. 따라서 평양에는 아쉬운 이별의 장면과 애달픈 노래가 많았다. 김동인의 <배따라기>도 사실은 사신들이 타고 떠나는 배를 노래한 ‘선리가(船離歌)’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작품이 정지상의 ‘송인(送人)’이다.

우헐장제초색다(雨歇長堤草色多, 비 그친 긴 둑에는 초록빛이 짙은데)/ 송군남포동비가(送君南浦動悲歌, 임을 보내는 남쪽 포구에 슬픈 노래가 퍼지네)/ 대동강수하시진(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은 어느 때나 다 없어질까)/ 별루년년첨녹파(別淚年年添綠波,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지거늘)
비 그친 대동강 둑에는 능수버들이 기약없는 이별을 예고한다. 버들가지는 이별하면서 꺾어 주던 정표다. ‘柳(버들 류)’를 ‘留(류)’로 읽으면 가지 말고 머물러 있기를 간청하는 징표가 되는 것. 여행객의 갈림길인 노량진의 노들강변, 광진구 광나루, 삼남지방의 경계인 천안 삼거리에는 수양버들이 많이 심어져 있었다. ‘수양버들 춤추는 길에 꽃가마 타고가네, 아홉살 새색시가 시집을 간다네~’ 아홉살 새색시도 이별의 아픔을 겪나 보다.
이재명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