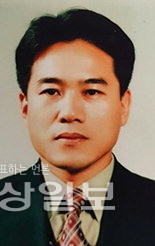
지난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는 낭보는 우리 모두를 들뜨게 했다. 산업수도 울산이 이제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인류문화유산도시로서 새로운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동시에 이 소중한 자산을 잘 관리 보존하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재미를 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반구천만큼 다양한 요소의 이야깃거리가 있는 곳이 드물지 않을까 싶다.
반구천 암각화에 나타난 다양한 고래의 형상들을 보고 있노라면 장생포 고래박물관 인근에 천연기념물 126호로 지정된 울산귀신고래 회유해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역시 선사인들의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도형의 예술성은 물론 신라 명문의 역사성을 함께 품고 있어 그 가치를 논할 수 없을 정도다. 그리고 반구천 일대에서는 수많은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돼 타임머신을 타고 먼 과거로 떠나보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반구천에는 고려 말의 충신 포은 정몽주의 얼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하다. 언양에 유배를 온 포은은 반구천을 찾아 시 한수를 지으니 그 시가 ‘중양절감회(重陽節感懷)’며, 조선 후기 언양 선비들이 포은 정몽주를 비롯한 3현을 모시는 서원을 반구천에 만들었으니 그 이름이 반고서원이다.
반고서원 건너편의 거북머리 형상을 한 기암절벽이 정몽주 호를 따서 지금도 포은대로 불리우고 있을 만큼 그 인연이 깊다. 그리고 반고서원 자리는 원래 신라시대 원효가 머물며 수행한 절터로 학계에서는 반고사터로 추정을 하고 있다.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은 경상도 지방 현감으로 있을 때 반구천을 방문하여 ‘언양 반구대’를 화폭에 남길 정도로 수려한 풍광은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아 온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반구천 상류에는 조선시대 아홉구비 절경의 자연 이치를 체득하면서 성리학의 이상을 실천하려 했던 구곡문화가 한때 자리잡은 자기 수양의 현장으로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그 옛날 공룡이 노닐고 고래가 평화롭게 유영했던 반구천에 이제는 포은의 충절과 원효의 통합 정신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그 언저리에는 겸재 정선의 풍류와 멋스러움 그리고 성리학의 이상향이 살아 숨쉬는 구곡문화가 함께하고 있음을 오늘의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일이다.
김병철 울산장애인재활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