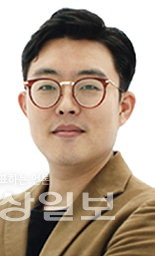
“우리는 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일하고 있을 뿐인가.”
이 질문은 필자가 울산을 떠났다 다시 돌아와 지난 10여년간 질문하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다. 산업화의 상징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울산은 여전히 시민의 삶을 담아낼 문화와 일상의 기반이 부족하다. 산업·주거·문화·여가가 단절된 구조 속에서 시민은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기 어렵다. 눈에 띄는 행사와 시설은 늘어나지만, 생활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험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제 울산은 ‘일하러 오는 도시’에서 ‘머물고 싶은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는 울산 곳곳에 들어선 문화시설, 공공 공간, 상업건축, 이벤트들이 저마다의 개성과 콘셉트를 갖추고 있음에도 도심 속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 건축물과 공간은 작품일 수 있으나, 그것이 이어지지 못하면 결국 단절된 구조를 낳는다.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단절 속에 점점 더 갇혀 지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지금 울산에 필요한 것은 공간과 건축의 완성도를 넘어, 도시 전체를 꿰어내는 ‘연결의 전략’이다.
그 출발점은 가장 큰 네트워크를 가진 대중교통, 곧 ‘역’이다.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르코르뷔지에는 기차역을 “현대 도시의 심장부”라 했다. 그는 역을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동선을 결정짓는 핵심으로 봤다. 현대 건축가 렘 콜하스 역시 기차역을 “도시와 세계를 잇는 네트워크의 노드(node)”라 정의하며, 교통거점이 도시의 미래를 규정한다고 말했다. 두 거장의 말은, 역이 단순한 환승 공간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이어내는 전략적 출발점임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유럽의 도시들은 이를 증명해왔다. 런던 킹스크로스역 재생 프로젝트는 ‘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19세기 석탄 창고와 화물기지를 재개발해 글로벌 기업 본사와 국제적 명문 예술대학, 주거·상업·문화 시설을 유치하며 과거의 산업 공간을 미래형 복합 플랫폼으로 탈바꿈한 대표적 성공 사례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앙도서관 역시 중앙역을 중심으로 세워진 10층 규모의 도서관을 단순한 자료관이 아니라 전시·공연·토론이 어우러지는 생활문화 허브로 만들고, 주변의 박물관·기업·상업·주거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역이 곧 도시 재생과 미래 전략의 중심임을 입증한 것이다.
울산에도 이러한 기회가 있다. 그 중심에는 태화강역과 울산역이 있다. 태화강역은 울산 도심의 핵심에 위치하며, 산업단지와 도심을 잇는 교차점이자 부산·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의 거점이다. 동시에 국가정원과 맞닿아 있어 산업과 자연, 생활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특별한 잠재력을 지닌다. 태화강역이 산업 전시, 기업 쇼룸, 국제 비즈니스 센터, 청년 창작공간, 생활문화·상업·주거 시설을 결합한 복합 플랫폼으로 발전한다면, 울산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새로운 무대가 될 것이다.
울산역 또한 주변의 컨벤션센터, 영남 알프스, 반구대 암각화, 국가산단과 연결돼 있으며, 이를 광역 교류 비즈니스 플랫폼과 연계해 관광·문화·생활 밀착형 공간과 함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울산역은 산업과 관광, 지역 생활을 유기적으로 이어내는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 울산의 다양한 산업과 관광 자원들이 두 역을 통해 주변 도시와 유기적으로 이어질 때, 울산은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새로운 좌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두 역이 개별적으로 발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체계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이다. 태화강역과 울산역이 거대한 축으로 이어질 때, 산업과 주거,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울산만의 네트워크가 완성될 것이다. 도시의 경쟁력은 건물의 크기나 숫자가 아니라 문화와 산업, 사람과 도시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지에 달려있다. 연결은 단순히 공간을 잇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어주고 교류하게 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한다. 이러한 연결이 가능할 때, 사람들은 머물고 싶어지고 도시는 살아 숨 쉬게 된다. 태화강역과 울산역이 그 두 축으로 자리 잡고 서로 연결될 때, 울산은 단순한 산업도시를 넘어 머물고 싶은 세계적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김범관 울산대학교 스마트도시융합대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