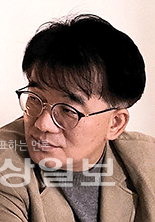
1.
무신정권기에는 전 기간에 걸쳐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일어났는데, 특히 정권 초기 약 30여년간에 걸쳐 삼남 지방에서 크고 격렬하게 발생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이며 특징적인 봉기가 김사미와 효심의 반란이다. 김사미는 농민 출신으로 청도에 있는 운문산을 근거로 부근의 농민 유망민을 규합, 강력한 세력을 이뤘다. 한편 울산의 초전에서는 효심이 지휘하는 농민군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작전도 상의하는 등 연합 전선의 태세를 갖춘 일면도 있었다. 1193년, 이들이 주현을 누비며 맹렬한 항거운동을 전개하자 조정에서는 대장군 전존걸(全存傑)에게 장군 이지순(李至純)·이공정(李公靖) 등을 거느리고 나아가 토벌하게 했다. 그러나 토벌군은 적군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거듭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고려사> <이의민전>에 의하면, 당시 실권자의 아들인 이지순이 토벌군 지휘자로 있으면서 반란군과 내통, 작전 기밀을 누설하고 반란군에게 군수 물자를 원조해 줬기 때문이라고 한다. 토벌군 사령관인 전존걸은 이지순의 통모 행위를 알고 있었으나, “법에 따라 처벌하면 그의 아버지가 나를 죽일 것이고 처벌하지 않으면 적의 세력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궁지에 몰려 자살하고 말았다. 이의민은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고 새 왕조를 세우기 위해 이들 농민 봉기를 이용했으며, 김사미 등은 경주 출신이며 경주이씨의 일족인 이의민을 이용, 그들의 소망인 신라의 부흥을 실현하고자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봉기는 당시 농민·천민 봉기에서와 같은 계급적인 문제뿐 아니라 경주인의 신라부흥운동을 비롯 당시의 지역감정 문제와 경주이씨의 족적 유대 의식 등 상당히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조정에서는 그해 11월 다시 상장군(上將軍) 최인(崔仁)과 대장군(大將軍) 고용지(高湧之)를 보내 대적케 해, 이듬해 2월 김사미가 항복함으로써 진압됐다. 효심 등은 그 후에도 계속 대항했으나 대규모의 토벌군에게 밀리던 중 밀성 싸움에서 한꺼번에 7000명이 죽게 되는 참패를 당해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고, 12월 효심이 사로잡힘으로써 항쟁은 끝을 맺게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운문을 근거로 한 농민 봉기군이 계속 존재해 정부에 반기를 들었음은 밀성 관노 투속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
밀성 관노 투속사건(密城官奴投屬事件)은 1200년(신종 3) 밀성(密城: 지금의 경상남도 밀양)의 관노들이 반란을 일으켜 운문(지금의 경상북도 청도)의 반란 세력에 투속한 사건이다. 1170년(의종 24) 무신정권이 수립되자 전국적으로 반란이 자주 일어났는데, 경상도 지방에는 운문의 김사미(金沙彌)와 초전(草田: 울산시 울주)의 효심(孝心)이 대표적이다(<고려사> 권 20, <세가> 20, 명종 23년 7월). 이에 정부는 상장군 최인(崔仁)을 남로착적병마사(南路捉賊兵馬使), 대장군 고용지(高湧之)를 도지병마사(都知兵馬使)로 삼아 토벌하도록 했다(<고려사> 권 20, <세가> 20, 명종 23년 11월). 김사미는 1194년 관군에게 투항해 참살당했다.
그런데 1200년 밀성의 관노 50여명이 관의 은그릇(銀器)을 훔쳐 운문의 반란 세력(雲門賊)에게 투속했다. 투속은 도망간 노비가 관가에 자수하고 본역(本役)에 돌아가던 일을 뜻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남의 세력에 기댄다는 뜻으로 투탁(投託)에 가깝다.
밀성 관노 투속사건은 김사미가 관군에 투항해 참살당한 1194년 이후에 일어났다. 이로 보아 김사미가 관군에게 참살된 후인 1200년에도 운문에 반란 세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들이 은그릇을 훔친 것으로 보아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데는 경제적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밀성의 공역노비(供役奴婢) 50여명이 경제적 궁핍을 이기지 못해 관아의 은그릇을 훔쳐 운문의 반란군에 투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밀성 관노 투속사건은 신분적·경제적으로 불우한 무지에 있던 노비들이 관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으로, 노비와 농민의 반란이 결합된 형태이다. 노비들은 같은 피지배층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곤란에 처해 있던 농민과도 자주 연합하게 돼 민란의 기세는 이후에도 좀처럼 약화되지 않고 주변 민중들의 호응을 받아 세력이 계속 이어진 것이다. 사실 김사미가 참형된 이후에도 효심의 세력은 계속 존재했으며 청도와 밀양에 걸쳐서 저항을 계속했다. 처음에 김사미와 같이했던 효심은 김사미가 이의민과 연계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이 이끄는 봉기군과 함께 밀주(밀양)로 이동했다. 이후 김사미의 봉기군은 내부 분열과 정부의 대규모 토벌군에 의해 고전하다, 결국 김사미가 참수되면서 진압됐다. 효심이 이끄는 농민군은 이후에도 저항을 계속하다가 밀양 전투에서 7000명이 전사하는 등 관군에게 대패하면서 전력이 크게 약화됐고, 효심이 사로잡히면서 진압됐다. 봉기군 7000명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기는 했지만, 당시 군현의 인구가 1000~2000명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봉기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3.
무신정권기에는 대규모 반란은 물론 소규모 도적의 무리 또한 들끓었는데, 도적의 대부분은 생계형 농민이었다. 노비 반란의 주체는 주로 관노였으며, 관노들은 대부분 관청에 소속돼 잡역을 담당한 공역노비였다. 고려시대 최하층 신분인 노비는 소유 주체에 따라 국가와 관청 소유의 공노비와 개인 소유의 사노비로 나뉜다. 사노비는 주로 양인이 가난해 스스로 몸을 팔거나 권세가에 의해 불법적으로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공노비는 전쟁 포로나 이적 행위자, 정변·반란을 꾀하다 실패한 자와 이들의 가족·사노비가 몰수돼 노비가 된 경우가 많았다. 공노비는 관청에서 잡역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급료를 받아 생활하는 공역노비와 따로 농사를 지으며 규정에 따라 공납을 부담하는 외거노비로 나뉜다. 외거노비가 토지를 경작하며 일반 소작농과 비슷한 생활을 한데 반해 공역노비는 관청의 직접적 수탈과 차별을 받았다.
이처럼 노비와 농민이 봉기한 가장 큰 원인은 관리와 향리들에 의한 가혹한 노역과 이로 인한 신체적 억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 반란이 특히 많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 노비와 농민에 대한 억압과 수탈이 이 무렵에 극심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이겠지만, 한편 무신 집권기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고 지방민과 하층민의 사회의식이 성장해, 이들이 사회 모순과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억압을 더 이상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항거하는 일이 많아진 것도 한 원인일 것이다. 밀성 관노 투속사건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진압됐다. 정부는 반란이 진압된 후 이에 가담했던 자들을 색출해 죽이는 등 반란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만 했을 뿐 봉기 지역의 백성을 달래거나 봉기가 일어난 근본 원인을 개혁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다.
송철호 한국지역문화연구원장 문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