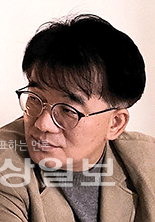
자고(子皐)는 공자의 제자이다. 그가 위나라 옥리(獄吏)였을 때 어떤 자에게 발꿈치를 자르는 형벌을 내렸다. 발꿈치를 잘린 자는 문지기가 되었다. 그의 스승 공자가 어떤 사람의 모함을 받아서 달아나는 일이 생겼다. 이때 발꿈치 잘린 자가 위기에 빠진 자고를 숨겨주어서 구해주었다. 위기에서 벗어난 자고가 발꿈치 잘린 자에게 물었다. “나는 군주의 법령을 허물 수 없어 그대의 발꿈치를 직접 잘랐소. 지금은 그대가 원수를 갚을 때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달아날 수 있게 한 것이오?” 발꿈치 잘린 자가 말하기를, “제가 발꿈치를 잘리게 된 것은 당연히 저의 죄에 합당한 것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의 죄를 판결할 때 다방면으로 법령을 살피고 앞뒤로 저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당신이 저에게 행한 것은 저에 대한 사사로운 편견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던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비자> ‘외저설 좌하’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한비자는 같은 편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위에 있는 자를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벌을 받거나, 잘못을 같이 저질렀는데도 누구는 벌을 받고 누구는 벌을 받지 않거나, 벌을 받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사람들은 억울함을 느끼고 원망하게 된다. 감형이나 사면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누구는 감형되고 누구는 감형되지 않는다면, 누구는 사면되고 누구는 사면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또한 원망하게 될 것이다.
공자는 “관리로서 훌륭한 자는 은덕을 백성에게 심어주지만 훌륭한 관리가 못 되는 자는 백성에게 원망을 심는다. 되는 곡식을 공평하게 나누는 도구이고, 관리는 법을 공평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죄를 범하고 그에 상당한 형벌을 받더라도 사람들은 윗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꿈치를 잘리는 형벌을 받은 자가 자고를 살려준 것이다. 법을 바르게 적용하려면 원칙대로 공평하게 하면 되고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군주의 눈물은 덕이지만, 우아한 냉정은 사사로움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대로 공평하게 하는 것이다.
송철호 한국지역문화연구원장·문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