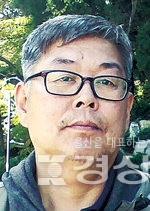
지난 16일이 초복이었고 오는 26일은 중복이다. 날마다 오는 비에 온 몸이 축 처지는 계절이다. 이럴 때 삼계탕 한 그릇은 온몸에 양기를 북돋운다.
삼계탕(蔘鷄湯)은 어린 닭의 뱃속에다 찹쌀, 인삼, 대추, 밤, 황기 등을 넣고 푹 고아서 만든 닭 요리다. 복날에 주로 먹는 이 음식은 한국의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다. 열량이 높아 삼계탕 한 그릇이 밥 세 공기의 열량을 웃돈다.
삼계탕은 원래 계삼탕(鷄蔘湯)이라고 불렀다. 고대 중국의 문헌을 보면 ‘백제 등에선 닭개장을 즐겼고 또 인삼도 약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백과사전 등에는 일제강점기 때 부자들이 백숙이나 닭국물에 인삼가루를 넣어 만든 것이 오늘날 삼계탕의 시초였다고 적혀 있다. 그러다 1950년대에 ‘계삼탕’을 파는 식당이 생겨났고 1960년대에는 비로소 ‘삼계탕’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1960년대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인삼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자 인삼가루 대신 말린 인삼을 넣어 지금의 삼계탕이 된 것이다.
삼계탕의 주 재료는 역시 닭이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영계(-鷄)’는 병아리보다 조금 큰 어린 닭을 말한다. 나이가 어린 이성(異性)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그 어원은 ‘연계(軟鷄:어린 닭)’에서 나왔다. ‘연’이 ‘영’으로 발음되면서 ‘영계’가 일상화된 것이다. 혹자들은 어린 닭을 의미하는 ‘young鷄’라는 조어를 만들기도 하지만 터무니 없는 용어일 뿐이다. ‘young鷄’가 있으면 ‘old鷄’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단어는 없다. 다만 ‘노계(老鷄)’만 있을 뿐이다.
삼계탕은 인삼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삼(蔘)은 순 우리말로는 ‘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심’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헌은 성종 20년(1489년)에 편찬된 <구급간이방언해(救急簡易方諺解)>이다. 허준의 <동의보감(東醫寶鑑)> ‘인삼조’에서도 ‘人蔘’ 바로 밑에 ‘심’이라고 한글로 표기했다. 심마니가 산삼을 발견하였을 때 세 번 외치는 소리 ‘심봤다’의 심이 바로 이 ‘심’이다.
복날 영계와 인삼은 환상의 조합이다. 코로나19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먹을 건 먹어야 버틸 수 있다. 이재명 논설위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