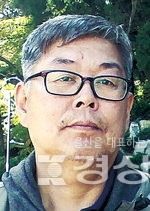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많은 시민들은 마지막 날 제야(除夜)의 종소리를 들으며 지난 한해를 반성하고 2020년 첫날을 맞는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뜻의 송구영신(送舊迎新). 올해만큼 다사다난했던 해도 없었다. 그런만큼 다가올 새해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찬 겨울 밤 등불은 깜빡이고 시간은 더디 가건만
(寒燈耿耿漏遲遲 한등경경루지지)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는 일은 속임(어김)이 없구나
(送舊(故)迎新了不欺 송고영신료불기)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는 단어가 오늘의 의미로 쓰인 것은 당말송초를 살았던 시인 서현(徐鉉)의 시 ‘제야(除夜)’에서 나왔다. ‘제야’는 7언 율시인데, 제2구에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나온다. 2019년 마지막 날 밤 등불을 밝혀 시간을 늦춰보려 하지만, 새해는 어김없이 찾아온다.

‘제야(除夜)’는 섣달 그믐날 밤을 말하는데, 긴 어둠을 걷어낸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다는 말이다. 또 다른 말로는 세모(歲暮), 제석(除夕)이라고도 한다.
그믐날에는 잡귀의 출입을 막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에 불을 켜놓았다. 이를 ‘수세(守歲)’라고 했다. 세월을 지킨다고나 할까. 만일 수세하지 않고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고 했다.
자정 무렵 가장 많이 기다리는 것은 제야의 종소리다. 이 종소리가 33번 울리면 한해가 가고 또 한해 오는 것을 실감한다.
제야의 종 행사는 불교에서 음력 12월 마지막 날 중생들의 백팔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하면서 108번 종을 치던 것에서 유래했다. 그런데 대부분 지방의 타종은 108번이 아닌 33번이다. 불교의 타종이 조선시대의 ‘파루(罷漏)’로 전이된 것이다. 파루는 도성의 4대문·4소문이 열리는 시간을 알리기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33번 타종한 것을 말한다.
울산시는 대공원에서 31일 자정부터 10분간 관계기관·단체장, 일반시민 등 48명이 6개조로 나눠 모두 33번을 친다. 송구영신을 기원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울산시민들은 무엇을 기원할까. 그 어느 도시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울산, 시민들의 백팔번뇌가 33번의 종소리를 타고 허공으로 흩어지기를 기원할 뿐이다. 올해도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는 일은 어김이 없구나. 이재명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