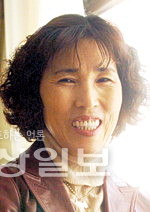
부여 여행은 언제나 쓸쓸하다. 사라져 버린 왕국의 실체는 잡히지 않고 무성한 전설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나절 그런 어렴풋한 흔적들과 마주하다 백마강을 건너 장하리 삼층석탑으로 향한다. 멀리서 봐도 백제계 석탑임을 알아 볼 수 있다. 백제 미학의 정수인 정림사지 오층석탑과 강을 사이에 두고 가깝게 있으니 제대로 모방을 했다. 고려시대, 옛 백제 땅인 충청남도와 전라도 지방에는 정림사지 오층석탑을 닮은 탑이 여러 곳에 건립되었다. 통일신라를 거치면서 정형의 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왕국에 대한 그리움을 백제계 석탑을 조성하며 달랬던 것은 아닐까.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예술을 사랑하는 백제인의 후예라고 자부한다. 하긴 신라는 거대한 황룡사 9층 목탑을 짓기 위해 백제의 장인 ‘아비지’를 모셔가지 않았던가.
보물 제184호 장하리 삼층석탑은 좁고 낮은 기단 배치와 일층 몸돌 네 귀퉁이가 배흘림기둥이다. 넓고 얇은 지붕돌에 수평에 가까운 듯 살짝 올라간 추녀 등 정림사지 오층석탑에서 보이는 양식이다. 조형미가 뛰어난 정림사지 오층석탑보다 수수하게 어여쁜 장하리 탑이 훨씬 정감을 자아낸다. 주변은 일부러 탑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처럼 자연스럽고 아늑하다. 그것이면 족하다. 먼 옛날 어떤 이름의 절집이 있었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탑이 서 있는 옆으로 민가 한 채가 있고 농부는 종일 밭일을 하는 모양새다. 부지런한 농부는 허리 쉼을 하며 오늘도 소박한 기원을 켜켜로 쌓아 올리고 있다. 꽃밭 너머로 장독대가 정갈하다. 어두운 밤, 별빛이며 달빛을 석탑과 함께 벗 삼았으니 장독들이 모두 부처의 형상으로 보인다.
다시 백마강을 건너 국립부여박물관으로 향한다. 박물관에는 장하리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사리 장엄구가 있다. 금박을 입힌 세 개의 목탑과 함께 상아로 깎은 아미타불입상도 기대된다. 금동제 사리병에 새겨진 날아가는 새와 구름무늬를 보면 잠시 백제인이 될 수도 있다. 배혜숙 수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