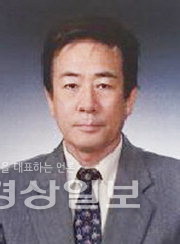
‘쓰레기’ 낱말의 뜻은 ‘쓸모없게 되어 버려야 될 것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또 다른 뜻으로는 ‘도덕적 사상적으로 타락하거나 부패하여 쓰지 못할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인간 쓰레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쓰레기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배출해 왔던 것들로, 초기에는 자연의 자정 능력 덕분에 생태계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 개체수의 급증과 인간의 이기심에 의한 소비단위의 급격한 증대에 비례해, 엄청난 쓰레기(기후위기를 초래한 온실가스도 이에 포함된다.)의 발생으로 이어지면서 차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되었다. 모든 환경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면 이러한 쓰레기로부터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쓰레기는 매립, 소각, 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 일반적으로, 먼저 재활용을 해서 매립이나 소각할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매립하되, 재활용도 매립도 되지 않는 쓰레기는 소각 처리한다. 그러나 모든 쓰레기를 완전히 처리할 수는 없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는 다른 대부분의 쓰레기와 달리 미생물이 분해할 수 없는(썩지 않는) 물질이다. 더욱이 소각시 유독물질(다이옥신 등)을 배출하기 때문에 함부로 소각하면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사용, 재활용으로 처리해야 하나, 실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결국 지상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이고, 넘쳐나는 쓰레기는 지구의 낮은 지역인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1997년 발견된 태평양의 거대 쓰레기지대(해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응집된 지역)는 12년 후인 2009년에는 두 배 가까이 커져, 한반도의 7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쓰레기섬의 99%가 플라스틱이다. 2015년 발표된 사이언스지에 의하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은 2010년 기준으로 매년 800만t에서 1270만t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됐다. 800만t은 우리나라 1년 어획량의 두 배가 넘는 엄청난 양이다. 그리고 이 속도로 해양오염이 진행된다면 2050년에는 물고기 보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더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욱이, 큰 플라스틱 쓰레기 조각들이 점차 더 작은 조각으로 쪼개지면서 ‘미세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 수프’를 형성하고 있다고 연구팀은 보고했다. 연구팀은 “미세플라스틱 쓰레기가 먹이사슬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면서 “전체 생태계의 영향을 가늠할 수 없지만,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크든 작든 매우 해로운 결과를 야기한다.”라고 했다. 지구 전체 바다를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 조각은 약 5조2000억개로 추정되며, 남극해역까지 지구의 모든 바다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반세기에 걸쳐 우리 인류는 단기적 경제효과를 우선하면서, 그동안 사용해 왔던 유리, 도기, 금속으로 만들었던 것을 급속하게 플라스틱으로 바꾸어왔다. 그것들이 인간과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인류 생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반세기가 지나서 겨우 알게 되었다.
이제는 플라스틱의 사용과 생산 자체를 재검토해야만 한다. 지구 온난화 문제와 더불어 석유로 만드는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상품의 생산·제공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과잉포장, 일회용사용을 억제함과 동시에 석유로 만드는 플라스틱 대신 바이오매스(biomass)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유리, 도기, 금속 사용을 권장하는 것도 해 볼만 하다.
콧구멍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힌 바다거북 사진, 비닐봉투에 목이 감긴채 살아가는 물개 사진, 고래 배 속의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의 발견 등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전세계 수돗물의 83%, 전세계 생수의 93%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생수의 93.4%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바 있다.
이제는 2016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채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이나, 1987년 오존층보호를 위한 국제적 합의(몬트리올 의정서)와 같은 국제적합의를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허황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