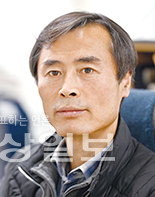
꼭 60년 전인 1962년 1월27일. 당시 정부는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했다. 같은 해 2월3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단인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하루 전인 1962년 2월2일자 한 전국 일간지는 1면 ‘울산공업쎈터의 전모 발표’라는 머릿기사에서 ‘정부가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상징인 울산을 인구 50만의 공업센터와 문화도시로 종합개발한다는 장기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후 울산은 ‘4000년 빈국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富貴)를 마련하겠다’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을 현실화시켰다. 산업수도를 넘어서 생태산업도시로 성장한 현재의 울산에 시민들은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발전사를 써온 울산의 저력은 눈부시다.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궈낸데는 정부의 집중적인 중화학공업 육성 우선 정책과 고난과 도전의 역사에도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던 기업체들의 투지와 노력이 있었다. 물론 종사자들과 시민들의 희생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라는 역병 속에 맞이한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은 축하 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새로운 100년 영광을 위하여’란 부제의 제2선언문비를 세우는 등 축제 속에서 맞이했던 10년 전 50주년의 분위기와는 극양지차다. 주력 제조업종의 부침 등으로 잃어버린 10년이라 할 정도로 급격히 위축됐다.
실질 성장률(2020년 기준)이 -7.2%로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고 개인소득 1위 자리는 서울에 내준지 4년이 됐다. 민선7기 울산시정이 9개 성장다리 사업을 추진하며 성과를 자평하지만 산업계는 공허하다는 의견이 많다.
인구의 급속한 유출은 도시공동화의 우려까지 더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1만3674명이 순유출됐다. 인구 순유출률(-1.2%)은 전국 최고다. 20대 -3.4%, 30대 -1.5% 등으로 유출폭이 가장 높아 울산의 미래를 걱정해야 될 처지다.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이유는 직업이다. 전체 유출인구의 40%에 달한다. 울산 경제의 추락이 직접적인 원인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결국 일자리가 관건이다.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에 대한 인식이나 배려는 이전보다 못한 듯하다. 시 등이 도시와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업의 울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체감은 달라 보인다.
“지자체가 일방적인 주민 입장만 아닌 지역의 큰 축을 담당하는 기업의 입장도 대변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드물게 직접적인 소통채널을 만들어 사회공헌 등 주민 지원활동도 하고 있는데…. (지역 곳곳에 내걸린) 붉은 글씨의 ‘대기업 이전’ 현수막을 볼 때면 안타깝습니다. 기업을 돈줄로 인식하고 의사와 상관없이 (정책 홍보를 위한) 성금을 종용하는 것도 이젠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이라고 부유식 해상풍력이나 수소산업 등에 너무 매몰돼 다른 경제 문제는 소홀한 느낌입니다. 미래 먹거리에 치중해 기존 주력산업은 홀대하는 것은 아닌지, 일자리 창출이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나 방안에 소홀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기업체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시는 대기업 중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은 롯데정밀화학 1곳 뿐이라고 했다. 향토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단순한 생산활동만 울산에서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전에 ‘산업수도 울산을 이끈다’는 제목으로 울산공장 CEO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당시 한 공장장은 “글로벌화는 기업이 국민을 사랑해 주고 국민은 기업을 배려해주는, 상생의 풍토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을 맞은 울산의 구성원들이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할 말인 듯하다.
신형욱 사회부장 겸 부국장 shin@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