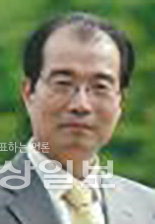
올해 2월3일은 울산시공업센터 착공 60주년 기념일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앙코르! 울산 1962’를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울산문예회관에서 막을 올렸고, 울산박물관의 특별기획전도 열고 있다. 울산이 다시 우뚝 일어서자는 취지로 예술인들과 울산시민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 행사를 준비했다는 소문이다. 그러나 울산시가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 자리매김하기까지 크나큰 희생을 치렀던 이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
돌이켜보면 수많은 울산사람들이 1962년 이후 조국의 공업화를 위해 수백 년 살았던 정든 고향마을을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다. 이주지에 정착할만 하면 또 이주하라는 정부의 졸속정책도 감내했다. 조국의 산업화에 기본적 자유인 ‘거주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마저도 박탈당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울산토박이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어느덧 60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울산시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 다만 고향을 잃어버린 마을 부근에 세워진 16개의 망향동산만이 험난했던 토박이 이주민의 사연을 알 뿐이다.
왜 하필 ‘앙코르! 울산 1962’인가? 공업센터지정 후 울산토박이의 피눈물 나는 이주사를 다시 ‘재연하자’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당시 울산토박이들의 이주 참상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 주제는 적당하지 않다. 그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1962년은 악마의 출현이었지 천사의 방문은 아니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그들을 회고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체의 노조와 노동자들은 겸손해야 할 것이다.
공단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된 여천동 외 6개 동은 5950가구, 2만7017명이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삼호, 태화, 다운지구로 이주했다. 그 보다도 먼저 1962년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연댐과 1968년의 대암댐 건설로 이주민이 발생했다. 특히 1963년 유공 울산정유공장이 들어섰던 고사동 110번지 일대 주민들은 부곡동으로 이주시키면서, 울산시가 이주민들에겐 고작 대형 텐트 1동과 리어카 1개를 제공했다. 텐트 1동에 반을 나누어 두 가구의 이주민이 생활했는데, 2년 후에는 ‘석유화학단지’ 부근의 갯벌지대로 철거당했으며, 정부에서는 이 갯벌지대를 간척사업을 해 농지를 철거민들에게 배분한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믿은 철거민들은 리어카로 부근 야산의 흙을 파가며 겨우 간척사업을 끝냈지만 간척지의 염분이 빠지면 분배해준다고 미루더니, 결국 정부는 철거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석유화학단지’를 설치했다. 당시 ‘석유화학단지’를 ‘밀가루 공사 땅’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주민들이 간척사업에서 받는 전표 10장이 밀가루 1포대 값이었다. 당시 이주민들에겐 리어카 1대가 생계 수단이었다. 1974년에 지정된 온산공단은 1980년대 일부 주민은 이주하고, 이주하지 않은 1만2000여 명은 공단에 포위되었으며, 3년 후에 공해병인 ‘온산병’이 발생하자 이들을 남창으로 이주시켰다. 더구나 1962년부터 유공에서 내품는 옥탄가스는 부곡동 주민들에게 고통이었다. ‘조국의 산업화’라는 명령에 의해 계속 반복된 이주와 낮은 보상비, 공해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보상은 없었다.
결국 울산공업도시는 수많은 토박이 이주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이제라도 ‘공업센터 지정 60주년’을 맞이해 이들 토박이 이주민들의 망향축제를 열어주어야 마땅하며, 망향동산을 산뜻하게 관리하는 것이 울산시와 공단 산업체의 임무이다. 이와 같은 울산시의 뜻 깊은 기념일을 맞아 울산토박이 이주민에 대한 행사가 없다는 점은 정말 유감이다. 다가오는 울산시 승격일인 6월1일에는 산업수도 공업화에 희생된 토박이 이주민들을 배려한 ‘감사의 축제’라도 펼쳐보면 어떨까.
이일걸 한국간도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