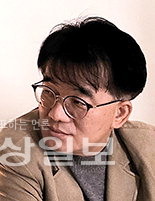
<근사록> ‘위학(爲學)’ 편에 ‘밝음이 아니면 움직임은 갈 곳이 없고, 움직임이 아니면 밝음은 쓸 곳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주역> ‘풍괘초구전(豊卦初九傳)’을 보면 ‘지(知)와 행(行)이 서로 필요로 하여 어느 한쪽도 버릴 수가 없으니, 앎이 밝지 않으면 움직임은 장차 어디로 가겠는가. 눈먼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여도 갈 곳을 모르는 것과 같다. 행함에 힘쓰지 않으면 밝음 또한 쓸 곳이 없으니, 발이 마비된 사람이 비록 보기는 하지만 갈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되어 있다. 주역은 근사록의 밝음(明)과 움직임(動)을 지(知)와 행(行)으로 설명하고 있다.
언뜻 생각하면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함께 해야 한다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밝음(明)이다. 밝지 않으면 움직임은 갈 데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밝음이란 어떤 의미일까. 주역은 밝음을 앎(知)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앎은 또 어떤 의미일까. 고대의 경전들은 앎(知)을 지혜(智)와 통용하는 경우가 많다. 맹자는 사단(四端)을 이야기하면서 인의예지 가운데서 지(智)를 ‘시비지심(是非之心)’이라고 했다.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다. 따라서 밝음(明)은 옳고 그름을 잘 안다는 뜻이다. 위의 근사록 위학 편의 문장은 옳고 그름을 잘 알아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이며, 옳고 그름을 잘 알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흔히 지행합일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지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 것에 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만약에 잘못된 지를 실행한다면 이것은 실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지행합일에서 지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곧 이성적 판단 능력이다. 세상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옳고 그름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은 세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것으로 역시 세상을 위태롭게 하는 데 동조하는 것이다.
송철호 인문고전평론가·문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