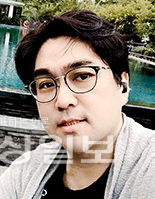
30년 넘게 그림을 그려오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 “어떤 그림을 그리나요?” 이럴 땐 한두 마디로 답할 때도 있고 한 시간 가까이 길게 답할 때도 있다. 질문한 사람에 따라 수많은 답이 존재하는, 쉽지만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이다.
질문 받은 찰나의 순간 나는 질문의 답을 위해 많은 생각을 한다. ‘내 그림의 재료나 표현법을 질문한 것일까?’ ‘내가 그림에 담은 의미를 질문한 것일까?’ 그러나 정작 질문한 본인도 어떤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느낄 수 있는 장르가 미술이기 때문인 듯하다.
도대체 미술은 이름만 해도 너무 많다. 동양화, 서양화, 추상화, 수채화, 유화, 연필화, 파스텔화, 민화, 구상화, 비구상화 등 표현방법과 재료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우리가 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구분은 동양화와 서양화다. 하지만 우리는 동양화와 서양화가 발생지역에 따른 구분으로 재료가 다르다는 것 정도만 배웠기 때문에 재료의 경계가 무너진 현대미술에서는 그 구분조차 쉽지 않다. 오히려 감상자의 입장에서 동양화와 서양화를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은 재료나 테크닉이 아니라 표현방법의 기준이 되는 개념이다.
동양화는 직관적이며 한 번의 터치로 그린다. 투시원근법과 명암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평면적이며, 터치와 선, 여백과 공간을 중요시한다. 반면 서양화는 화려한 색과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다. 원근법의 구도를 통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생생하게 표현하며 논리적이다. 물감을 덧바르거나 깎는 식으로 층을 구성하기도 한다. 표현방식에 따라 구상화, 비구상화, 추상화로 나눈다. 구상화는 구체적인 형상이 있는 그림,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림을 말한다. 비구상화와 추상화는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구분이 쉽지 않다. 비구상화는 표현하는 대상은 있으나 형상은 표현하지 않고 느낌만 표현한다. 추상화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포, 알레고리, 상징 등 느낌이나 감정을 선, 형태, 색채, 질감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작품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아이가 호랑이라고 그렸지만 내가 보기엔 전혀 호랑이 같지도 어떤 동물 같지도 않은 그림이 비구상화이고, 새로 사준 크레파스로 벽이나 바닥에 아이 마음대로 선을 긋고 색칠하는 마구잡이 낙서는 추상화라고 할 수 있다.
미술을 분류·설명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까다롭지만, 사실상 이런 단어적인 지식은 미술의 감상에 있어서는 중요치 않다. 비평가 그린버그, 디자인의 목적성에 대해 주장하는 헤겔, <예술의 종말 이후>의 저자 단토 등 수많은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오랜 기간 예술과 현실, 예술의 감상에 대해 토론하고 있지만 미술의 정확한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리가 되어 우리의 교육과정에 쓰이고 있는 미술의 정의는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시각이미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예술의 한 영역’(2015 개정 미술교육과정)이라고 교육하고 있다. 작가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시각적 표현방법의 과정이나 결과가 현대의 미술이라면, 미술을 감상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결과물의 분석이 아니라 작가의 생각과 마음을 보고 느끼는 것이라 하겠다. 무엇을 얼마나 잘 그렸는가 보다 왜, 어떻게, 표현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울산에도 시립미술관이 생기고 아트페어도 자주 열리고 있다. 사설 화랑도 속속 생겨나고 전시회도 많다.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선 전시회나 아트페어를 자주 방문해 많이 보는 것이 생활 속 깊숙이 들어온 미술을 즐기는 방법이다. 혹 전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발견했다면 먼저 작가를 검색해보는 것도 그림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다. 작가의 나이와 성별, 태어난 장소와 성장한 환경을 이해하고 작가의 글이나 인터뷰를 읽어 작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난 뒤 다시 작품을 보면 훨씬 친근하고 쉽게 다가온다. 관람객이 많아지면 지역미술의 수준도 더불어 높아진다. 새해엔 울산시민들이 미술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정영진 갤러리 리아 대표 삼영화학 대표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1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