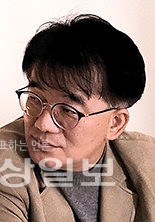
“열 아들을 키운 부모 / 하나같이 길렀건만 / 열 형제가 한 부모를 / 어이하여 못 섬기나”,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에 전하는 ‘권효가’의 한 구절이다. 다른 구절을 보면, “아름다운 이 세상에 / 한평생을 누리는 것 / 부모님의 크신 공덕 / 아니고서 있을소냐 / 후생모육 그 은혜는 / 하늘보다 크건만은 / 청년 남녀 많은 중에 / 효자 효부 귀할새라”. 그렇다. 우리는 부모의 공덕으로 아름다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누리고 산다. 그런데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드물다.
‘권효가’에는 자식들의 불효 행태를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현대어로 쉽게 풀어놓은 내용을 보자.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겨하며 /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네.” “개가 아파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며 / 늙은 부모 쓰러지면 예사로이 생각하네” “자식 위해 쓰는 돈은 계산 없이 쓰건만은 / 부모 위해 쓰는 돈은 계산하기 바쁘구나 / 자식들을 데리고서 바깥외식 자주하며 /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번 힘들구나”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나면 효심 날까 / 예문 갖춰 부고 내고 조문받고 부조 받네.”
<맹자>에는 오륜이 나온다. 그중 ‘부자유친(父子有親)’이 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애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라’라는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라는 상호 개념이다. 여기서 상호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친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부모에게 친애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자식은 그저 받기만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5월8일은 어버이날이다. 전통적으로 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이다. 그러므로 전통적 가치관에서 본다면 효는 당연한 해야 하는 일상이므로 어버이날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어버이날이 있는 것은 다만 그날이라도 부모님께 효도 좀 하라고 있는 것이리라. 그러니 이날만이라도 나는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송철호 한국지역문화연구원장·문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