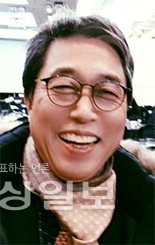
정년(停年)은 무엇이며 왜 있는가. 계급정년도 있으나 통상 연령정년을 말한다. 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지 오래다. 사회 모든 제도가 양면성이 있으나 정년제만큼 두 얼굴을 가진 제도는 드물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요소의 하나로 도입된 이 제도는 정년까지 소신껏 직무에 전념하게 하는 한편, 정년에 퇴직함으로써 조직에 꾸준한 신진대사와 활력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문제인력’도 큰 잘못이 없는 한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부작용이 있는 반면, ‘유능인력’도 나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직을 떠나는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년제가 백년 안팎의 짧은 세월 동안 신분보장이란 짙은 화장으로 존재를 과시해 왔으나 이제 100세 시대에 그 민낯을 보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됐다.
우리 역사에도 정년은 있었다. 치사(致仕) 또는 퇴로(退老)라 하여 나이 70이 되면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했다. 그러나 당시 평균수명을 볼 때 정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벼슬의 고하를 떠나 치사하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했고, 오늘날 각 성씨 문중의 치사공파(致仕公派)는 그 후손이다. 직업공무원제를 도입한 미국이 오히려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 금지법(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1967)’으로 일찍이 정년을 없앴다. 영국도 ‘연령차별 금지법(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s, 2006)’에 따라 65세 미만 정년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본도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서구제국도 70세 정도로 하거나 없애는 경향이다.
연령에 의한 고용의 차별은 크게 두 경우로, ‘채용’ 시의 차별과 ‘해고’ 시의 차별이 있다. 한국에서 연령에 의한 채용의 제한은 위헌(헌법 불합치)이라 하여 일반 공무원 등 채용 시 나이 상한이 폐지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연령에 의한 해고 즉 정년퇴직이 아직 합법으로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들 때나 나갈 때나 논리는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두 얼굴의 정년제가 보편적 헌법논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금에는 인사의 영역을 넘어 연금과 재정, 실업문제, 나라 경제체력에까지 결코 긍정적이지 못한 변수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런데 정년을 연장하거나 없애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하는가. 노인과 청년 간에 일자리 대체효과 즉 이른바 ‘세대 간 밥그릇 싸움’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일찍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청년실업 대책으로 조기퇴직을 권고했으나 그 영향이 별로 없음이 밝혀졌다. 즉 완숙자와 초심의 할 일이 따로 있더라는 것이다. 오히려 노인 복지비 부담만 더 심해져 2005년에 권고 철회했다. 한국에서도 2019년에 대법원은 보험금 산정 시의 노동가동 연한을 65세로 판결한 바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도 그 근본 원인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장으로 인한 경제체력 약화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년제가 그 역사 초기엔 분명 순기능을 했으나 점차 무능자에게 철밥통을, 유능자에게 퇴출을 부여하는 역기능을 보여 왔다. 연금재정과 노인 복지비 대책 차원에서도 정년은 연장되고 폐지돼야 한다. 합리적인 임금피크(임피)제와 조화도 필요하다. 정년 전에 임금을 줄이고 정년을 보장해주는 사이비 임피제는 혁파돼야 한다. 임피제는 본래 정년을 연장하되 그 기간 동안 임금을 감하는 것이다. 실적과 능력이 있고 본인이 원하면 연금 대신 임피로 일하게 하는 것이 맞다.
다만 고용의 취사는 본인의 선택이다. 계속 일하느냐 연금으로 사느냐는 개인 사정이나 판단에 맡길 일이다. 더욱이 오늘날 ‘일반 인공지능(AGI)’ 시대에 젊음이나 숙련에 의한 ‘속도근로’는 이미 자연인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근로는 질과 생산성이 관건이고 실업도 근본적으로 자원 배분의 문제이지 나이나 세대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정년제는 고용에 있어 공리적(公理的)기준이 아니다. 최대한 빨리 폐지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전충렬 전 울산부시장·행정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