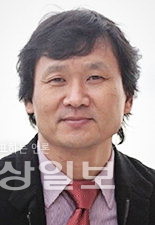
울산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시내로 진입하려면 삼호동을 마주하게 된다. 삼호로와 남산로로 둘러싸인 길쭉한 삼각주 모양의 삼호동은 도심속에 숨겨져 있는 보석같은 마을이다. 분주한 자동차의 흐름과 혼돈에서 벗어나 마을 안으로 한걸음 들어서면, 태화강을 뒤로하고 남산을 바라보고 있는 매력적이고 정겨운 마을을 만날 수 있다.
삼호(三湖)의 명칭과 관련해 전하는 유래는 두 가지이다. 그 중 하나는 사군탄(使君灘), 낭관호(郞官湖), 해연(蟹淵)이라는 세 곳의 여울과 호수가 있어 붙여진 지명이라고 하고, 또 따른 하나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문수보살의 계시를 받고자 영취산으로 향할 때 문수보살의 현신인 동자승이 나타나 길을 인도하다가 이곳에 이르자 돌연 사라져 왕이 크게 세 번 탄식하며 불렀다(三呼)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도 한다. 동자승의 사라짐을 보고 경순왕은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 왔던 신라의 마지막 운명을 직감 하였다고 하니 그 부르는 소리와 탄식이 얼마나 애절 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지금의 삼호동은 1980년대 남구 용잠동이 석유화학공단으로 조성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공해를 피해 이주한 마을이다. 마을 조성 후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마을의 쇠퇴가 심화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울산에서 최초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주민역량 강화와 새로운 도시 기능의 도입과 창출 그리고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지원이 필요한 쇠퇴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동반 성장 구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즉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생명력이 움틀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도시의 낙후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장소로 변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도시정비는 토지, 건물 소유자 중심으로 개발이익에 집중하고 주로 주택과 기반시설과 같은 물리적 환경정비를 목표로 진행된다. 따라서 기존 거주자들의 생활권과 장소의 문화적, 역사적 기억과 가치가 소멸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반면에 도시재생은 거주자중심의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력기반확보 및 지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적 유산과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울산에는 13개 지역(남구 3, 동구 2, 북구 3, 중구 3, 울주군 2)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울산 최초의 삼호동 도시시재생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여의 노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주민들의 애잔한 마음을 위로하던 안식의 마을이 이제는 수많은 철새들이 찾아드는 사람, 철새,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의 마을로 변신했다. 도시 재생사업 전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혼란하던 정광로는 남산과 태화강을 이어주는 생명의 길, 매력이 넘치는 길로 변화했다. 특히 가을이 되면 샛노란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마법같은 황금빛 세상이 된다.
골목골목 작은 정원을 가꾸던 손길과 마음, 마을공동체를 위해 귀한 시간과 열정을 다해주신 주민들, 남다른 혜안(慧眼)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남구청장님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담당 공무원들과 삼호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의 헌신이 삼삼오오 모인 주민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삼삼호호’의 마을 삼호동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가능하게 했다.
최근 삼호동 끝자락의 와와삼거리에 보석 같은 조형물이 세워졌다. 무지개 형상의 조형물에는 생명의 강인 태화강의 풍요한 흐름, 십리대숲을 찾아드는 철새들의 부드러운 날개 짓,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암시하는 새알들과 둥지를 박차고 하늘로 비상하는 철새들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 도시재생이란 힘든 잉태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삼호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는 조형물로 여겨진다.
힘든 일상에서 따뜻한 위로와 편안한 휴식이 필요할 때면 한번쯤 ‘삼호동 철새그린마을’을 방문해 보시길 권유한다. 지친 철새를 품는 안락한 둥우리처럼 우리를 너그러이 품고 안아주는 위로의 공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삼호동에는 언제나 안식과 치유 그리고 그리움이 있다.
이규백 울산대학교 교수 울산공간디자인협회장


